
안토니오 가우디의 설계로 바르셀로나에 세워진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 성당. 새와 곤충의 집에서 영감을 얻은 가우디는 작업실에 거꾸로 매단 형태의 성당 모형을 설치해 건물 각 부분에 가해지는 힘을 계산했다(오른쪽).사진제공 현암사
호리병벌은 거의 완벽한 형태의 백자 항아리를 빚어 집으로 삼는다. 정원사새는 짚으로 집을 지은 뒤 조개껍질로 인테리어를 한다.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드물지 않게 보아온 소재들이다.
연구서로는 카를 폰 프리시의 ‘동물의 건축학’(1974)과 니콜라스 콜리아스의 ‘동물의 외부 구축물’(1975)이 ‘집짓는 동물’에 대해 대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책은 생물학자가 아닌 건축사학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책들과 구별된다. 요약하자면, ‘인간은 동물로부터 건축을 배울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동물에 비해 인간의 건축물은 얼마나 다양하며 화려한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물 건축법 백과사전’이 있다면, ‘인간’항목도 다른 동물 못지 않게 간단할 것이다. 바닥을 다지고 고른 뒤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는다. 이어 지붕을 올린다. 역사상 여러 시대와 문명권의 ‘집짓기’는 이 단순한 방법의 ‘변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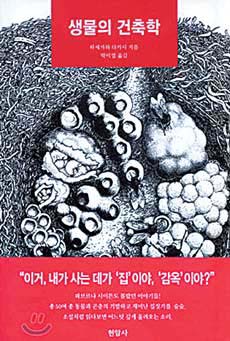
이 단순성은 ‘중력의 지배에 대한 저항’에서 나온다고 저자는 말한다. 무너짐에 대한 강박 때문에 인간의 건축물은 규구준승(規矩準繩·컴퍼스 자 수평기 먹줄)으로 대변되는 단순 기하학적 도형을 갖게 됐고, 현대에 이르러 감성이 배제된 ‘냉정한 합리화’의 폐해를 겪게 됐다는 것.
이에 비해 동물의 건축법은 훨씬 더 환경순응적이며 소재와 에너지의 낭비가 적다. 많은 새와 곤충들은 ‘땅에서 일으켜세우는’ 방식 대신 ‘아래로 늘어뜨리는’ 방법의 건축술을 택한다. 베짜기새의 경우 야자수나 바나나에서 섬유를 빼내 집을 ‘뜨개질’한다. 이렇게 ‘드리워진’ 집은 중력에 순응하고 있으므로 강한 비바람 속에서도 원형 보존력이 강하다.
인간이 뜨개질한 집에서 살 수는 없는 일. 그러나 자연에서 배운 ‘늘어뜨리기 기술’은 이미 인간의 위대한 건축물로 승화되었다고 책은 설명한다. 안토니오 가우디가 바르셀로나에 세운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성당이 그런 사례. 이 건물은 기존의 통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반(反) 기하학적 곡선과 유기적 형태를 갖고 있다.
현대 구조학과 역학이 완성되기 전인 1880년대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설계했을까? 가우디는 작업실 천장에서 무수히 작은 주머니를 매달아본 결과 역학적으로 안정된 곡선들을 얻었던 것이다. ‘하늘에서 늘어뜨린 집’을 뒤집은 모양이 바로 이 성당이라는 것.
베짜기새만이 인간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다. 흰개미의 집은 자연의 공기순환장치를 통해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섭씨5도나 되는 냉각효과를 얻는다. 흰개미들이라면 인간이 무조건 단단하고 두꺼운 외벽과 단열재를 사용, 쓸 데 없이 냉방비를 소모한다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가장 적은 자원으로 가장 큰 강도와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낳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인간 아닌 꿀벌의 6각형 벌집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생활장치는 환경에 대해 너무나 공격적이다. 동물의 둥지는 본질적으로 방어적이지만 외형의 소박함 속에 내부의 안락함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야 겨우 동물의 둥지 문 밖에 당도했고 안내자가 나타나 주기를 고대할 따름이다”
원제 ‘生き物の建築學’(1992).
유윤종기자 gustav@donga.com
김동주의 여행이야기 >
-

작은 도서관에 날개를
구독
-

특파원 칼럼
구독
-

정세연의 음식처방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김동주의 여행이야기]태국 매홍손 '카렌족의 여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3/10/21/690577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