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개막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임재용 총감독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다음 달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등지에서 열린다. 2017년 ‘공유도시’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비엔날레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주제는 ‘집합도시(Collective City)’.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도시”라는 슬로건도 내걸었다.
올해 비엔날레에는 베를린, 파리, 암스테르담, 울란바토르 등 전 세계 80여 개 도시 18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총감독은 건축가 임재용(국내), 미국 시러큐스대 교수 프란시스코 사닌(해외)이 공동으로 맡았다. 지난달 31일 임 감독(58)을 광화문에서 만났다.
―세계 각국에는 ‘건축’ 비엔날레가 많다. 왜 서울은 ‘도시건축’ 비엔날레인가.
―‘집합도시’란 주제는 무슨 뜻인가.
“원래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니까 도로, 지하철 같은 인프라가 더 중요해지고, 사람은 거기에 끼여 사는 느낌이 돼 버렸다. 시스템 중심으로 된 도시를 사람 사는 곳으로 되살리자는 것이다. 도시는 일반 시민이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간인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도시’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도시를 만드는 방식은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는 톱다운 방식이었다. 이제는 주민들이 먼저 마을을 만들고, 전문가가 지원하는 상향식 프로세스가 주목받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 정부가 집합적인 노력으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도시를 공평하게 누릴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걷기 편해야 한다. 런던 도심에서는 모든 길이 2차선으로 좁다. 길 건너편에 있는 보행자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부를 수 있어야 도로를 오가며 걷게 된다. 반면 국내 신도시는 도로가 왕복 8∼10차선 대로다. 공원이나 상가로 가려면 수백 m 간격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서울 광화문 도심이 회복된 계기는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부터다. 사람들이 지하도로 건너지 않고 지상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도시 풍경이 확 바뀌었다.”
―요즘엔 ‘숨은 골목 찾기’가 트렌드인데….
“수많은 골목들이 반짝 떴다가 진다. 바람이 불고 외부인 유입, 젠트리피케이션의 패턴이 반복된다. 요즘에는 3, 4년을 못 버티는 것 같다. 도시재생이 삶과 연결되려면 건물주와 임대인, 지자체가 스마트한 협약을 맺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도 ‘집합도시’의 이슈다.”
―국내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은….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과 도심 제조업 보존도 논란인데….
“도시는 생물체 같은 것이다. 무 자르듯이 옮기거나 녹지로 만들 수 없다. 경제적인 합의점도 찾아야 한다. 세운상가 주변은 어마어마한 삶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아무리 신축 건물이 좋아도 시간이 주는 위대함을 무시 못 한다. 비엔날레 기간에 세운상가에서는 ‘시장(市場)’을 주제로 한 현장 프로젝트가 열릴 예정이다.”
전승훈 문화전문기자 raph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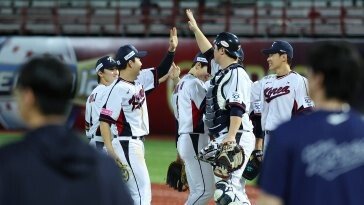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