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종이에 원하는 일들을 적고 그것을 실천했다고 하지요. 우리 부부에게도 버킷리스트는 있었죠. 저는 ‘죽기 전에 낡은 집을 사서 내 맘대로 고쳐보기’였고, 남편은 ‘농사를 지으며 시골에서 살아보기’였지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에 프랑스의 아름다운 고성(古城)을 사들여 수리해 나만의 살림집으로 꾸미고, 8200여㎡(2500평)의 농토와 정원을 가꾸며 사는 부부가 있다. ‘나는 프랑스 샤토에 산다’의 저자인 허은정 씨(54·줄리 허)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처음엔 자그마한 시골집을 찾던 허 씨는 프랑스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면서 귀족이 살았음직한 웅장한 샤토(고성)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게다가 낡은 고성의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다. 실제로 호주 신문에는 ‘시드니의 작은 아파트 값이면 프랑스의 고성을 살 수 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5년 반 동안 허 씨는 프랑스에서 매년 3~4개월씩 머물면서 고성을 수리해왔다. 호주 시드니에서 23시간에 걸쳐 비행기를 타고, 3시간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해서 찾아가야하는 먼 길이었다. 집수리 도중에 욕실에서 물이 새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등 끊임없이 고생한 이야기가 책에 가득하다. 그러나 프랑스 시골마을의 벼룩시장과 앤티크 숍을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쓰던 오래된 가구와 거울, 접시를 사서 나만의 집을 꾸미는 이야기는 흥미를 자아낸다. 허 씨가 고성을 매입한 가격은 약 10억 원, 수리비는 3억~4억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허 씨는 “한국에서도 아파트에 살았고, 호주에서는 현대식 건물에 살았지만 오래된 집에서 풍기는 ‘올드 소울’(Old Soul)을 늘 그리워했다”며 “이 공간엔 누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 가구를 쓰던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하며 대화를 나눈다”고 말했다.

그의 되살려낸 고성에서의 삶은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등의 인테리어 잡지와 인스타그램으로 소개되며 관심을 끌었다. 그를 인터뷰한 미국 잡지의 제목은 ‘Courage to Fly Home’이었다. 시드니에서 23시간에 걸쳐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서 수리를 하는 그의 삶을 담은 기사였다. 허 씨는 벽지를 벗겨내고, 철골만 남아 폐허가 된 집을 수리하던 도중에도 고성에서 홀로 잠을 잤다고 한다. 그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집이 우리를 선택한 것 같아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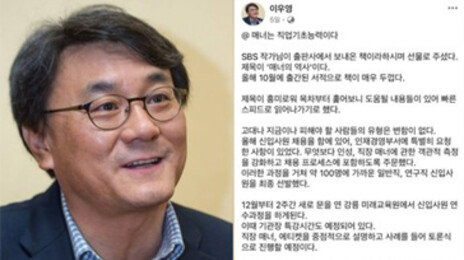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