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코끼리 없는 동물원’ 펴낸
청주동물원 수의사 김정호 씨


2001년부터 충북 청주동물원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호 씨(47)는 어느 순간 자신의 직업이 딜레마로 다가왔다. 동물을 사랑해 수의사가 됐지만 일터인 동물원이 과연 동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 의문이었다. 20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다음 달 1일 출간하는 에세이 ‘코끼리 없는 동물원’(MID)에 담았다. 그를 전화 인터뷰로 만났다.
“사람들은 동물권을 위해 동물원을 없애자고 해요. 하지만 해외에서 온 동물들을 당장 방사했다간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죽고 말 겁니다. 전문가 보호가 필요한 멸종 위기종도 많습니다.”
김 씨는 동물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물원을 즐기는 방법을 귀띔했다. 동물원들이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이면을 들여다보라는 것. 새 모이주기 체험처럼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프로그램은 보통 시작 전 동물을 굶긴다. 묘기를 부린 후 사육사로부터 먹이를 받아먹는 프로그램도 비슷하다. 반면 동물들의 건강검진을 지켜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동물에 무해하고 특히 이들이 사람과 비슷한 신체기관을 가진 생명임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동물권을 존중하는 동물원을 방문하면 동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씨는 언젠가 모든 동물원이 찾아오는 손님보다 그곳에 사는 동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꿈꾼다. “먼 미래에 모든 야생동물들이 사람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면 그땐 동물원이 모두 사라져도 괜찮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동물들이 살기 좋은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 좋아요
- 2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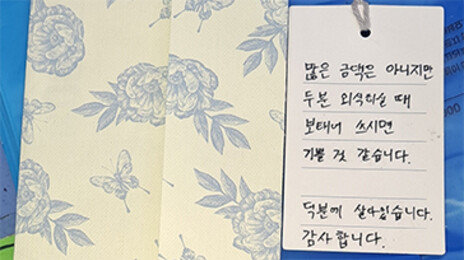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