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년 07월 31일
플래시백
“일본의 조선인 동화정책과 일본어 주입식 교육제도는 우리에게 치명적 속박이다. 동화정책은 조선인에게 의식을 잃게 할 뿐이고 물질적 행복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연단에 선 42세의 한국인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어 ‘조선에 대한 자본 투자는 순전히 일본인을 돕기 위한 목적’이며 ‘국유지를 차지한 동양척식회사가 일본인 농부한테만 좋은 기회를 주는 바람에 조선인은 만주나 중국으로 쫓겨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YMCA) 총간사 신흥우는 미국 하와이에서 13개국 150여명에게 이렇게 조선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1925년 6월 30일부터 2주일간 열린 제1회 ‘태평양회의’의 둘째 날 일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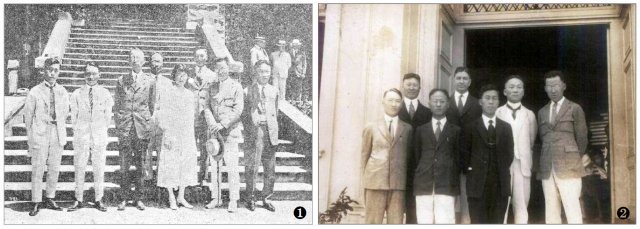
태평양회의는 태평양연안 여러 민족의 종교 이민 교육 문화 통상 산업을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민간학술단체 태평양문제연구회가 주도했죠. 개인 자격 참석이었기 때문에 나라 잃은 조선의 대표들도 하와이 동포들의 요청을 받아 동참했습니다. 국가 단위 참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태평양회의에서 입김이 강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었죠. 일본 참석자들은 자국의 식민지정책이 통렬하게 비판당했으니 속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속 쓰리기는 미국인들도 비슷했죠. 미국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대표가 튼튼한 정부가 수립되면 독립시켜준다고 해놓고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통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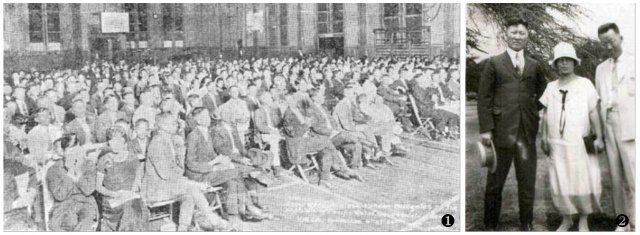
일제는 종교‧교육‧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조선 대표들의 태평양회의 참석을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총독부가 여권을 내주지 않으려 한 이유였죠. 경성부가 여비를 대주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일본 대표로 가라는 뜻이었죠. 이도저도 다 거부하고 독자 참석하자 여객선에서 일본과 조선 대표 사이에 냉기류가 흘렀습니다. 회의 도중에도 독립국만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조선 대표들이 돌아가겠다고 짐을 쌀 정도였죠. 그렇지만 조선 대표들은 자체 회의를 여는 등 식민지 조선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고 머리를 짜냈습니다. 동아일보 1925년 6월 11일자 사설처럼 ‘이런 기회라도 이용해 우리 현실을 현실대로 여실히 발표하고 인도적 양심과 정치적 상식에 호소하는’ 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고 보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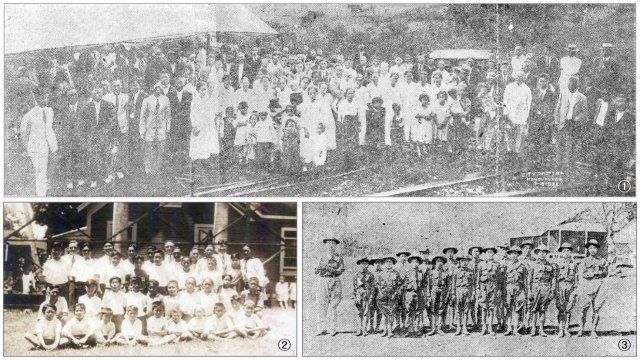
이맘때 동아일보 주필로 돌아와 있던 송진우는 조선 대표의 한 사람으로 6~8월 3개월 가까이 태평양회의 기사를 썼습니다. 6월에는 일본을 거쳐 하와이로 가는 여정을 4회로 소개했고 7월에는 열하루의 태평양 횡단기를 3회 실었죠.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간 뒤 관부연락선으로 시모노세키에 도착해 도쿄로 이동할 때는 18세에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유학을 단행했던 패기와 치기를 함께 떠올렸죠. 기차를 긴 집으로 오해했고 벤또(弁当)를 ‘멜똥’이라고 발음하며 처음 타는 인력거 좌석이 위험해 보여 신발 놓는 아래쪽에 올라앉아 웃음거리가 됐던 일들 말입니다. 과거로 떠나는 송진우의 시간여행이었던 셈이죠. 세월이 지나며 눈치는 늘고 기개는 줄었다며 스스로 한탄했지만 독립을 향한 집념은 더 굳어졌습니다.

신흥우의 연설이 동아일보 1면에 실린 때는 대표단이 귀국한 뒤인 7월 31일이었죠. 이제 조선 대표의 활약상이 독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송진우는 지상중계 격인 ‘태평양회의에’를 4회, 주요 참석자 인터뷰인 ‘태평양회의를 중심으로’를 6회 연이어 실었습니다. ‘태평양회의를 중심으로’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유력인사들이 3‧1운동에 감동했고 동정심을 품게 됐다는 소감과 응원을 매회 전했죠. 또 하와이 동포들의 감격 어린 환대와 함께 이승만과의 만남도 소개했습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탄핵을 받아 임시대통령에서 면직됐고 그가 이끌던 구미위원부도 폐지됐을 때였죠. 송진우는 ‘내야 무엇을 하였어요. 도리어 동포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참지 못할 뿐이오’라는 이승만의 심경을 전하면서도 외로움을 딛고 독립운동에 분투하는 그의 진지하고 위대한 인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과거 기사의 원문과 현대문은 '동아플래시100' 사이트(https://www.donga.com/news/donga100)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아플래시100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전문의 칼럼
구독
-

인터뷰
구독
-

정미경의 이런영어 저런미국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동아플래시100]집에 가축, 사람까지 모두 쓸어가 버린 을축년 대홍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8/06/10840610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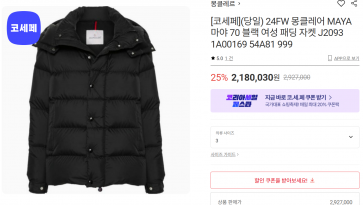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