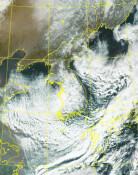80년대 후반 미국 뉴욕의 허드슨강에서 정기적으로 선상()연주회를 열었던 바이올리니스트 배익환씨의 취미는 요리였다. 가난한 유학생이던 그 시절 배씨는 음악회를 지원해준 미국인 후원자의 집을 방문해 손수 요리를 해주곤 했다고 한다. 그에게 요리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었던 셈이다. 80년대에는 한국 남자들 중 배씨처럼 내놓고 요리가 취미라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이젠 아니다. 사회 명사들 중에도 요리하기를 즐긴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않는다던 한국 남자의 가부장 의식이 그 사이에 많이 완화된 것일까?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씨도 소문난 요리 마니아다.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아내에게 요리할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는다고 고백할 정도다. 그는 최근 정명훈의 Dinner for 8이라는 제목으로 번듯한 요리책까지 냈다. 정씨 부부와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장래 반려자를 포함한 8명의 식탁을 완벽하게 차려낼 수 있을 때 자신의 삶이 완성된다는 뜻에서 붙인 제목이라니 정씨에게 요리는 가족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가 보다. 요리는 내 인생을 풍요롭게, 일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라며 예찬론을 펼치는 그는 9월 1일 서울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도 갖는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요리를 사랑하는 음악가가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요리사 정명훈씨를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똑같은 재료를 써도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 음식 맛은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재료를 다루는 방법과 가열온도, 조리순서에서부터 그릇에 담긴 모양과 색깔에 이르기까지 맛을 결정짓는 변수는 수없이 많다.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리를 지적() 예술이라고 추켜세우는 이들도 꽤 된다. 하지만 요리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정성과 사랑이 아닐까. 자신이 공들여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볼 때의 행복감, 그것이 바로 요리를 하는 진짜 맛일 터이다.
독일 속담에 훌륭한 요리사는 좋은 의사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요리하는 남자는 주변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의사일 수 있다. 남자가 만든 음식을 먹는 가족은 그의 사랑도 함께 먹는 것일 테니까. 요리하는 남자가 많아질수록 세상의 행복지수도 한결 높아질 게 분명하다. 남자가 주방에 서면 체통이 떨어진다는 낡은 생각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 요리에 문외한인 한국의 남자들이여, 이번 주말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한번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송 문 홍 논설위원 songm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