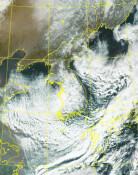만나고 돌아섰을 때 두고두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시집도 비슷하다. 덮었을 때 두고두고 생각나는 시가 있다. 사람이나 사람이 낳은 시나 별반 다르지 않다. 나중에도 생각나는 시가 나에게 좋은 시다.
김지헌 시인의 ‘곤드레밥’이 바로 그런 시다. 왜 좋으냐를 따지자면 첫 번째는 ‘그냥’이다.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마음이 시를 좋아하는데 이유 없다. 그래도 더 말해보라 하시면, 이 시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다고 대답하겠다.
영화에는 대사 하나 없이 그저 배경음악과 연기만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다. 대사 한 줄 없는데 감독의 의도가 확 느껴지기도 한다. 이 시는 말로 이루어졌으면서도, 대사 없는 영화 장면과 닮았다. 주인공은 냉동실 문을 열고 곤드레를 꺼내 밥을 한다. 혼자 앉은 밥상에서 간장을 쓱쓱 비벼 한 공기 다 먹는다. 밥을 다 먹으니 배 속은 쓸쓸치 않으나 표정은 여전히 쓸쓸하다. 주인공에게 클로즈업되는 우리의 시선은 마지막 문장을 읽고야 만다. 아무리 애써도 조연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인공은 덤덤하게 살아내고 있다.
곤드레와 주인공, 그리고 인생의 조연은 각각의 셋이면서 결국은 하나다. 셋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이 시에는 있다. 그 하나를 붙잡고 살아내는 힘도 이 시에는 있다. 그래서 자꾸 돌아보게 된다. 저 부드러운 곤드레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해야지 싶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