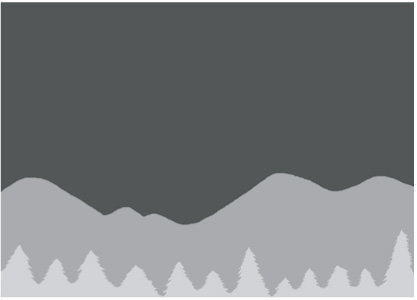

“누가 밤 속에 이미지를 갖다 놓았는가? 꿈이다.”
― 파스칼 키냐르, ‘은밀한 생’ 중
밤은 얼굴조차 없는 부재의 시련이다. 우리는 빛에 매혹된 자, 빛에 길들여진 자, 빛의 노예들이다. 밤을 만나면 처음에는 세계가 칠흑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다가 차츰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난다. 우리에게 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의 눈은 끔찍하게 밝은 대상에게만 쏠려 있다가 눈이 멀게 될 수도 있다. 파스칼 키냐르는 스탕달이 쓴 이야기를 예로 들며 이렇게 쓰고 있다.
“잘츠부르크의 소금광산에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진 자작나무 가지들을 어두운 폐광 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는다. 두세 달 후에 그것들을 꺼내보면 나뭇가지들은 반짝이는 결정체들로 덮여 있다. 굵기가 멧새 다리만 한 가장 작은 가지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움직이는 듯한 다이아몬드들이 무수히 붙어 있다.” 탁월한 예술이란 어떤 것인가? 표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구덩이로 들어가는 나뭇가지 같은 자들의 밤은 어떠한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원래의 나뭇가지는 보석이 달린 나뭇가지들 얘기로 끝이 나고 있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에게 결코 밤을 권하지 않는다. 달콤하고 밝은 매혹의 불빛만을 권한다. 나는 괴롭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관하여 결코 함부로 주변과 상의하지 않는다. 인간들은 오직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대목에서만 찬성할 것이므로. 아마도 세상의 어머니들만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밤을 이야기해주며 어마무시한 밤을 가르쳐주는 것 같다.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하여 시인들도 밤 같은 어둡고 깊은 동굴 내벽에 손을 집어넣는다. 밤을 만지며 밤을 경험한다. 모든 생명체들은 잠을 잠으로써 밤에게서 도망치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우리는 거기 버티고 있는 밤의 이미지 한 조각을 늘 보고 있다. 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