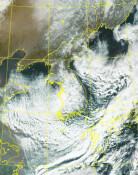“오, 미친, 이 우스운, 알 수 없는 세상이여! 보라, 그녀가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그녀가 얼마나 붙잡고 싶어 하는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단편 ‘밀물’ 중
주인공 케빈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열셋에 떠났던 고향을 찾는다.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던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올리브와 우연히 마주친다. 이때부터 생을 마감하려는 그의 계획은 어그러진다. 시답잖다 못해 불편하기까지 한 이야기를 꺼내는 옛 선생이 빨리 가버렸으면 하면서도 그녀가 떠나지 않길 바라는 또 다른 자기 자신 때문이다.
세상이 얼마나 ‘미쳤고(insane) 우습고(ludicrous) 알 수 없는지(unknowable)’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전쟁과 질병, 각종 재난이 밀물처럼 다가오는 상황에서 절망과 무력함을 느끼지 않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을 이루며 살아가지 않던가. 주변에서 불어나는 ‘물’은 보다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때로는 동네 목욕탕에서 매주 마주치는 어르신도 이에 해당한다. 말수가 줄어든 가족, 카톡 메시지 속 언어가 심히 흐트러진 친구, 때수건으로 뺨만 밀고 계신 어르신…. 도처에 숨은 구조 신호는 대부분 사소하고 은밀해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야 만다. 괜한 참견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가해한 소용돌이로부터 당신의 주변을 건져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밀물 속에 있다면, 부디 구조 신호를 보내자. 결국 케빈은 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패티가 바다에 빠진 걸 목격하고선 위험천만한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에 이른다. 자살하려던 사람이 타인을 구하고자 기꺼이 움직이는 이 장면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보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붙잡고 싶어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