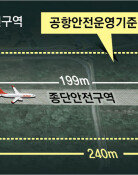언스트 곰브리치가 쓴 ‘서양미술사’는 1950년에 발간된 이후 800만 부 이상 팔린 세계적인 밀리언셀러다. 688쪽에 이르는 이 두꺼운 책에 여성 미술가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1994년 독일어 개정증보판을 찍으면서 단 한 명이 추가됐는데 그가 바로 케테 콜비츠다. 대체 어떤 여성이었기에 이 유명한 책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콜비츠는 1871년 프로이센 왕국 시절,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미술을 공부한 후 24세 때 의사를 만나 결혼하면서 민중의 삶에 눈뜨게 된다. 남편은 베를린 외곽에 무료 진료소를 열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콜비츠 역시 하층민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담은 작품들을 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콜비츠의 삶과 예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둘째 아들 페터가 전사했기 때문이다. 겨우 열여덟 살이었다. 아들을 잃은 엄마는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술가로 거듭났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콜비츠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목판화 연작이 들어간 작품집을 냈는데, 그중 ‘엄마들(1922∼1923년·사진)’이 가장 유명하다. 여러 명의 여성이 보호 장벽을 치듯 서로를 껴안고 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엄마들도 불안하고 두렵기는 매한가지지만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강해질 수밖에 없다. 서로 의지한 채 단단한 덩어리가 된 이들의 모습은 조국의 명예를 위해 자식을 전쟁터로 내보낸 독일 어머니들의 고통과 희생을 환기시킨다. 탐욕스러운 군국주의의 모험에 자식을 잃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된다. 씨앗을 짓이겨서는 안 된다.” 반전의 화가 콜비츠의 외침이다. 그는 전쟁과 폭력으로 자식을 잃은 모든 어머니를 대변하는 예술가였다. 비록 곰브리치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후대의 미술사가들은 그를 20세기 독일 미술을 대표하는 최고의 민중 예술가이자 판화가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