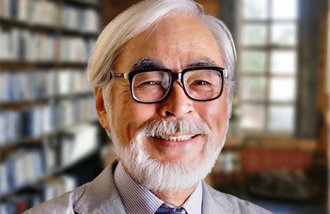“48년 동안 창신동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어려운 건 처음입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차경남 씨(65)는 텅빈 봉제공장 내부를 허탈한 듯 바라봤다. 그는 40여 평의 이 공장을 세를 주며 운영해 왔지만, 현재는 직원은커녕 각종 봉제 장비도 사라진 상태였다. 차 씨는 “더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올해 2월에 공장을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도 안 나갔다. 청바지 공장도 운영 중인데 그곳도 걱정”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60여 년간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국내 봉제업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1960년대 섬유산업 호황으로 봉제공장이 몰린 창신동 일대엔 ‘드르륵’ 하는 미싱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창신동 골목은 매일 아침 옷을 주문하러 온 동대문시장 상인들로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와 중국 ‘인스턴트 패션’ 기업 쉬인을 통해 값싼 옷들이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봉제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일대에서 숙녀복 공장을 운영하는 박만본 씨(55)는 “중국산 저가 의류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줄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날 오후 창신동 봉제골목 거리 곳곳에는 ‘40평 임대’라고 붙인 안내문과 불 꺼진 봉제업체들만 가득했다. 통상 가을과 겨울 옷을 만드는 10월은 업계 성수기로 알려져 있지만 봉제골목에선 더 이상 활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제2의 앙드레 김과 우영미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배출할 패션 학원들도 최근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이날 기자가 방문한 창신동 일대의 패션 학원 5곳은 폐업해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한 건물 관리인은 “패션 학원에서 배우면 취업이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올해 2월에 폐업하고 나갔다”고 했다. 정재우 동덕여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는 “국내 봉제업이 죽으면 전후방 산업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며 “기술력과 단가 모두 중국이 앞서 있어 업계를 되살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