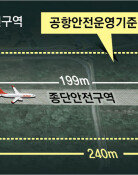전통-현대 접목한 한국공연 환상적

비지 맨(Busy man).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총지휘하는 존 모건(사진) 총감독의 별명이다. 페스티벌 사무국의 직원들은 그를 이름 대신 비지 맨이라고 불렀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실험극장 프로듀서, 글래스고 TAG 시어터 컴퍼니의 매니저를 역임한 그는 지난해 7월 이곳의 총감독으로 부임했다. 3일 점심시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한 그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만 명이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모여든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세계에서 공연팀뿐 아니라 극장, 기획사 관계자들도 모인다. 이곳에 오면 세계 공연계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가장 멋진 것은 세계 각지의 공연을 통해 서로의 문화가 뒤섞이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
1999년 난타의 성공적인 데뷔 후 이곳을 찾는 한국 팀이 늘고 있다. 한국 공연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듣고 싶다.
환상적이다. 지난해 코리아 프린지 쇼케이스를 보고 좋아하게 됐다. 한국 팀들은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믹싱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다. 지난해 전통 무술과 현대 공연을 결합시키는 점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비보이 공연도 마찬가지다.
난타 점프 이후 이곳을 찾는 많은 한국 팀에 조언을 해준다면.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점프처럼 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작품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영국 팀도 많이 성공하지 못한다. 프린지에 대한 선명한 인식이 필요하고 공연의 성격과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가져와야 한다. 치밀한 마케팅 전략도 필수다. 이곳 관객들과 저널리스트들은 그리 관대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이곳에 나가는 작품들이 대부분 마셜아트나 비보이를 활용한 비언어극이라는 비판이 많다.
사실이 아니다(Its not true). 지난해 보이첵의 경우 뷔히너의 동명 희곡을 새롭게 각색해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는 공간이다 보니 비언어극이 선호되는 경향은 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린지가 상업적으로 변해 간다는 비판도 있다.
나도 예술성이 강조된 공연들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문제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다 보니 예산이 넉넉지 않다는 것이다. 이곳에 진출하는 팀들 중에는 실패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여기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프린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가 요즘 가장 큰 고민이다.
유성운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