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Posted January. 21, 2019 07:47,
Updated January. 21, 2019 0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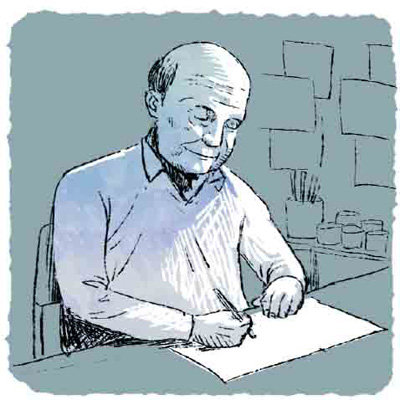
“변화는 피상적이다.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존 버닝햄 나의 그림책 이야기’ 중
4일 영국 그림책 작가 존 버닝햄이 82세의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다. 속이 뻥 뚫리는 비유를 담은 그의 그림 언어를 더는 만날 수 없다.
버닝햄은 1960년대 초 미국의 모리스 센댁과 함께 그림책의 시대를 열었다. 그의 책들은 현대인의 일상 문제의 핵심을 사정없이 고발하고 야유했다. 2006년 출간된 ‘존 버닝햄 나의 그림책 이야기’에는 그의 일생이 담겨 있다. 다양한 화보와 기록에서 자유롭고 진보적이며 억압에 저항하면서도 유쾌한 주인공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알 수 있다.
그의 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의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2차 대전 중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다. 가족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아버지를 따라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생활했다. 버닝햄은 그 덕분에 학교를 아홉 곳이나 다니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늘 전쟁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다. 줄곧 ‘부모에게 묻는 날’이 국경일로 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 이유다. 그가 낸 그림책들 중 일부는 부모 세대를 불편하게 했다. 어쩌면 자기 부모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들이 그의 그림책 전부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도 역시 부모도 세상도 답해 주지 않는 많은 질문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아이들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그들과는 다르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던 젊은 시절은 가식이었는지 모른다. 답을 찾으려는 사이 젊은이들은 어느새 부모가 돼버렸다. 모든 것이 변할 테고 달라질 거라 생각했지만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그의 그림책을 펼쳐놓고 읽어야겠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신무경 fighter@donga.com
Headline News
-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asks Yoon to appear at the investigation office
- KDIC colonel: Cable ties and hoods to control NEC staff were prepared
- Results of real estate development diverged by accessibility to Gangnam
- New budget proposal reflecting Trump’s demand rejected
- Son Heung-min scores winning corner k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