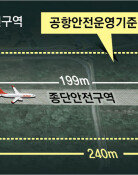소리를 잃고 싶었다
소리를 잃고 싶었다
Posted June. 03, 2020 07:33,
Updated June. 03, 2020 07:33

영화가 끝나고 이어지는 맺음 자막에 낯선 헌사가 펼쳐진다. ‘눈으로 말하고 듣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그렇다면 감독의 부모도 영화 속 부모처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인이었다는 말일까. 감독도 영화 속 주인공 소녀처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최근 상영 중인 김진유 감독의 영화 ‘나는 보리’는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가족 중 유일하게 농인이 아닌 보리는 날마다 소리를 잃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어머니와 아버지, 남동생이 수화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고 소외감마저 든다. 그만큼 순진하다는 말이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자 보리는 이어폰을 끼고 음량을 최대한으로 높여 보기도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보리는 급기야 바다에 뛰어든다. 물질을 많이 한 해녀의 귀처럼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농인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보리는 소리를 못 듣고 말을 못 하는 척하면서 농인으로서의 삶을 체험하게 된다.
장애인 가족을 다룬 영화라고 하면 상처를 증언하고 관객의 동정심에 호소할 것 같지만 ‘나는 보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영화는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을 보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설득한다. 장애인을 다르다고만 보는 게 더 차별이라는 것이다. 영화는 장애인 가족이 다른 가족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어쩌면 더 지극하고 더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이 여느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그 증언에는 서사의 권위가 있다. 감독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에 가능한 권위다. 보리처럼 감독도 부모가 농인이다. 그리고 보리처럼 감독도 어렸을 때 소리를 잃고 싶었다. 중요한 것은 상처나 절망에서가 아니라 가족들이 일구는 사랑에 합류하고 싶어 소리를 잃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 영화가 차별이나 상처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영화인 이유다. 문학평론가·전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