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있는 것의 소용
피어있는 것의 소용
Posted October. 04, 2021 07:10,
Updated October. 04, 2021 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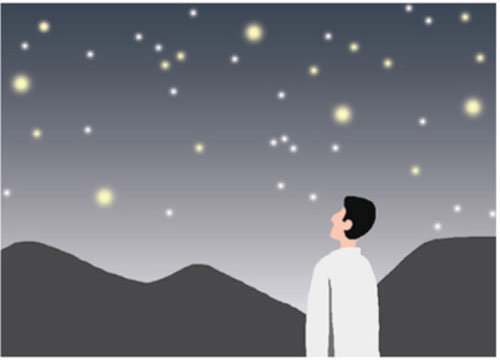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수학을 연구하느냐고. 봄 들녘의 제비꽃은 제비꽃으로 피어 있으면 그뿐이지 않은가. 피어있는 것의 소용은 제비꽃이 알 바 아니다.” ―오카 기요시 ‘수학자의 공부’ 중
밤하늘을 바라보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라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나’에 대해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을 기억한다. 그 경외심과 살아있는 듯 반짝이는 별들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천문학을 하게 됐다. 이런 나를 포함해 주변의 천문학자들이 자주 듣는 질문이 “천문학해서 뭐하냐”다.
천문학. 다소 낭만적으로 들리는 이 학문의 쓰임새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멋진 답을 천재 수학자 오카 기요시가 쓴 ‘수학자의 공부’라는 책에서 찾았다. 사실 분야를 막론하고 학문에서 그 쓰임새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설령 제비꽃은 제비꽃으로 피어있으면 그뿐이라 할지라도, 다수 학문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쓸모가 있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은 물론이고 영역이 분명해 보이는 공학 분야도 깊이 보면 표면적으로 알려진 소용 외에 수많은 쓰임새가 있다.
천문학도 마찬가지다. 천체망원경에서 사용하는 전자결합소자장치(CCD)는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쓰이게 됐고, 전파천문학 관측기술은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의료영상 시스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의학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학문인 천문학은 과거 대양 항해나 농경사회에 필수적이었다. 지금은 위성항법과 천체 관측으로 지구 자전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정밀한 시간과 위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선인터넷의 표준인 와이파이(Wi-Fi)도 블랙홀에서 나오는 전파 관측 신호를 분석하려다 탄생했다. ‘피어있는 것의 소용’은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
Headline News
-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asks Yoon to appear at the investigation office
- KDIC colonel: Cable ties and hoods to control NEC staff were prepared
- Results of real estate development diverged by accessibility to Gangnam
- New budget proposal reflecting Trump’s demand rejected
- Son Heung-min scores winning corner k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