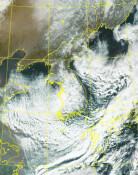1930년대 들어 군축 약속을 어기고 노골적으로 침략 야욕을 드러낸 나치 독일을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는 평화 제스처로 달래려고 했다. 1938년 뮌헨회담에서 체코 병합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히틀러로부터 평화 약속을 받은 체임벌린은 영국 국민에게 이제 유럽에서 전운()은 사라졌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몇 년 후 독일은 프랑스를 기습 공격해 불과 한 달 만에 파리를 포위했다. 이때 제1차 세계대전의 국민영웅 페탱 원수가 나서 히틀러와 손을 잡는다. 프랑스를 남과 북으로 나눠 총 한 방 안 쏘고 파리를 내준다. 대신 남부 비시에 친독 정권을 세워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 페탱의 부관이었던 드골 장군은 결사 항전을 외치며 런던으로 망명한다.
종전 후 드골은 페탱에게 망명을 권고한다. 군 시절 상관이 법정에 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페탱은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자신이 히틀러와 협조함으로써 프랑스 남쪽이 독일군에 짓밟히는 것을 막았다고 자부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페탱은 국가반역죄로 사형선고를 받는다. 국가지도자로서 적 앞에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흐리게 했다는 것이다. 분열된 국론 속에서 당시 많은 프랑스 지식인이 히틀러와 협력하고 레지스탕스를 탄압했다. 다음 죄목은 적을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것이다. 페탱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 기업은 독일을 위한 군수품을 생산했고 많은 프랑스 청년들이 독일의 군수공장으로 보내졌다.
특검으로 양파 껍질 벗기듯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대북송금을 보면 왠지 프랑스의 오욕스러운 과거가 떠오른다. 전임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던 통치행위라고 말한다. 페탱도 종전 후 자신의 친독() 행각을 통치행위로 합리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대북송금의 불법성이 하나씩 드러나는 지금,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의 항변은 국민 앞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역사를 되돌아볼 때 위협적인 군사력을 지닌 이웃을 가진 국가지도자의 고민은 똑같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하느냐는 것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평화 제스처다. 상대국이 합리적으로 행동한 경우 이 방법은 성공했다. 그러나 히틀러를 믿고 협조한 체임벌린과 페탱은 철저히 실패했다. 국민을 기아선상에 몰아넣으며 핵을 갖고자 하는 북한과 평화적 노력을 하다 불거진 전임 대통령의 대북송금은 어떻게 평가받을까? 결국 국민과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어쩌면 당장의 특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역사의 눈일지도 모른다.
안 세 영 객원논설위원서강대 교수 syahn@ccs.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