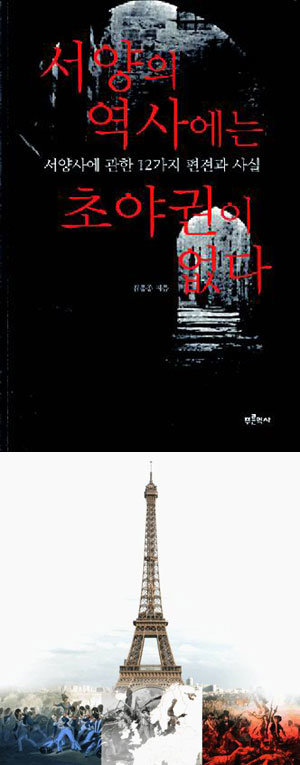
청색, 백색, 적색의 프랑스 국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누군가 이런 퀴즈를 낸다면 우리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라고 답할 것이다. 정말 그럴까. 저자인 김응종 충남대 사학과 교수는 이를 근거 약한 서구 예찬의 발로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삼색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프랑스혁명 발발 사흘 뒤인 1789년 7월 17일이다. 국민방위대 사령관인 라파예트가 파리를 상징하는 적색과 청색의 2색 휘장에 프랑스 국왕기의 색깔인 백색을 넣어 만든 것이다. 그것은 국왕과 혁명 파리가 손을 잡았다는 의미였다.
또 3대 정신은 프랑스 혁명의 표어가 아니었다. 1848년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표어였다. 삼색기와 3대 정신을 연결할 근거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 2조에서 삼색기를 국가 상징물로 규정하면서 공화국의 표어로 3대 정신을 함께 규정한 것뿐이다.
특히 3대 정신 중 박애로 번역되는 fraternite(형제애)는 박애라는 고결한 뜻과 거리가 있었다. 이 단어는 형제애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구호에서 드러나듯 국내외의 동지와 적을 구별하는 폭력적 의미를 띠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자유가 자유주의, 평등이 사회주의를 낳았다면 형제애는 민족주의를 낳았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 책은 이처럼 신화화한 서구 근대역사의 이면을 12가지 주제로 나눠 들춰 낸다. 그것은 숭고한 대의명분을 내세웠던 서구 혁명의 소름끼치는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은 종교개혁이 이율배반적으로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를 폭로하는 것이다. 또 근대화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암흑기로 낙인찍힌 중세와 절대왕정기의 긍정적 측면을 복권시켜 주는 것이다.
무혈혁명이라는 찬사를 듣는 영국혁명은 영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꼽히는 1차 세계대전보다도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만큼 피로 물든 내전이었다. 프랑스혁명 기간에는 방데 지역의 내전으로만 20만 명이 학살됐고, 대외 전쟁으로 200만 명의 프랑스인이 사망했다. 러시아혁명은 희생자가 최소 5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가공할 비극을 낳았다.
막스 베버가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칼뱅은 나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너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상의 폭력가였다. 칼뱅의 지도 아래 있었던 주네브 시의 인구는 1만6000명에 불과했지만 그의 첫 통치 5년간 13명이 교수대에 매달리고, 10명이 목이 잘리고, 35명이 화형당하고, 76명이 추방됐다.
농노가 결혼할 때 봉건영주나 가톨릭 사제가 농노의 신부와 먼저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초야권()은 봉건시대를 접고 중앙집권을 확립하려 했던 군주와 구체제를 비판하려 했던 계몽주의자들의 협업이 만들어 낸 신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도 제시된다.
저자는 또 서구의 민족이 근대에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역사가의 임무는 전통 만들기에 앞장 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전통의 거짓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맥락에서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참여의사로 그 구성원이 결정되는 국민주의와, 혈통이라는 배타적 기준으로 구성원이 결정되는 민족주의로 구별할 것을 제안한다. 또 여전히 역사가 아닌 국사를 고집하는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계를 비판한다.
서양사학자로서 방대한 사료를 제시하며 서양사의 신화화를 비판하고 민족주의의 극복을 주장하는 그의 논리는 명쾌하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판하는 글을 3편만 읽었다는 저자가 국내 학자들이 고구려사가 왜 한국사인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대목에선 명쾌함의 대가로 동서의 균형성을 잃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권재현 confett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