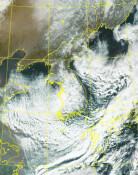어제 5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는 소규모 선거임에도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드러냈다. 계파분파 정치가 활개를 치며 정당정치를 왜곡시켰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배타적 지역주의도 변함이 없었다.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한 선심성 득표전략도 후유증을 걱정케 한다. 여당이 내건 경제 살리기와 야당의 정권 심판론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씨가 소속정당인 민주당 지도부와 공천 문제로 갈등을 빚다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대의명분에 반하는 선택이었다. 그는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던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한 순간에 버리고 당선이 확실시되는 옛 지역구인 전주 덕진에서 출마했다. 지역주의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전주 완산갑()에 신건 후보까지 끌어들여 무소속 연대를 급조했다. 정당정치에 대한 조롱이다. 야당의 미래나 정책에 대한 비전은 실종되고 누가 호남의 적자()이냐를 놓고 아전인수식 설전만 난무했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양쪽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의원은 낮에는 민주당, 밤에는 정동영을 지원한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경북 경주에서도 정당정치가 도전을 받았다. 이 지역에선 한나라당 정종복 후보와 무소속 정수성 후보가 당내 친이(친 이명박)계와 친박(친 박근혜)계의 사실상 대리전을 벌였다. 친이계는 이번 선거의 성패도 중요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역학관계의 변화를 우려해 정종복 후보를 총력 지원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논란도 불거졌다. 박근혜 전 대표는 오해를 의식해 중립을 지켰지만 책임 있는 정당 소속원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계파 간 갈등이 선거 때마다 도지는 고질병처럼 돼 버렸으니 한나라당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유일한 수도권 지역인 인천 부평을()에서는 여야 지도부 모두 GM대우 회생 방안과 관련해 시장원리를 짓밟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시되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를 왜곡시켰다. 경제 논리를 무시한 정치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레이 영 GM본사 부사장이 한국 측의 선() 지원을 요구하며 GM대우 포기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영남인 경주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인 전주에서 발을 붙이지 못해 지역주의의 철옹성은 여전히 두터웠다.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고, 민주당 후보는 야당 후보에 표를 몰아주기 위해 자진 사퇴했다. 정치공학적 선거구도가 건전한 정당 대결을 압도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은 금배지에 목을 맨 하류()정치가 춤을 추는 선거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