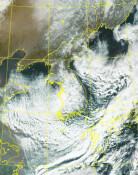노벨상 발표 시즌인 지난해 10월 미국의 유력 경제잡지 포브스에 흥미로운 칼럼이 하나 실렸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인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중 이민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노벨상이 생긴 1901년 이후 화학 의학 물리 분야의 40%를 미국이 휩쓸었는데 이 중 35%가 이민자 출신이라는 통계를 제시한다. 지난해도 경제학상 수상자 3명 중 2명이 이민자(프랑스, 인도)이고 화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도 영국과 캐나다 출신이다.
칼럼의 의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제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이민자로 노벨상을 받은 105명의 80%가량이 1960년대 초 미국의 이민제도가 완화된 이후에 수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민 규제가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근거를 나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셈이다.
이민자가 경쟁력 있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칼럼에서는 거기까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에 지인을 통해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세계적인 유대인 석학들과 친분이 많은 그는 유대인 친구들에게 노벨상을 많이 받는 이유를 물었더니 “오랜 기간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창의성이 발달한 게 가장 큰 원인 같다”는 답이었다고 했다. 실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다. 생소한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하는데,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배양됐다는 말이다. 세계 인구의 0.2%인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2%가량을 수상한 것을 보면 일리가 있는 해석이다.
문화의 접목이 ‘대박’으로 이어진 예는 많다.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는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 시애틀에 있는 작은 체인이었으나 하워드 슐츠가 경영을 맡고 10년 만에 미국을 휩쓸었다. 경영학자들은 ‘테이크 아웃’ 문화만 있던 미국에서 커피를 앉아서 마시는 우리식 다방 같은 공간을 제공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1990년 후반 한국에 진출한 스타벅스의 성공 요인은 거꾸로 테이크 아웃이라는 ‘서양문화’를 들여온 것이다. 뉴욕 맨해튼에선 얼마 전까지 일본 음식인 스시(초밥)를 어설픈 젓가락질로 먹는 서양인이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요즘에는 도복을 입고 ‘명상’을 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따라하는 것 같지만 새로운 문화 탐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색다른 문화의 수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로벌 감각을 키워야 한다. 예를 들면 동서남북 방위를 배울 때 세계 지도를 놓고 미국은 영국의 어느 쪽이냐, 일본은 중국의 어느 쪽이냐, 베트남은 태국의 어느 쪽이냐 하는 방식으로 세계 지리를 머릿속에 넣기도 한다.
경험 많은 기업인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면 훨씬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에 없는 것을 찾아 들여오거나, 외국에 없는 한국 고유의 것들로 외국에서 사업하면 그만큼 성공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중국 명나라 때 서예가 동기창(童基昌)이 말했다는 ‘독만권서 행만리로(讀萬卷書 行萬里路·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의 여행을 하라)’는 그래서 아직도 유효한 교육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