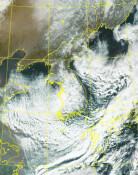라테를 좋아한다. 정확히는 카페라테. 아이스로 마시면 좋다. 특히 이런 계절에.
그러나 인생에는 어두운 시절도 있게 마련이다. 라테는 모르고 우유만 알던 때. 이것은 정신적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다. 인류 역사로 치자면 현대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유년기. 인간에게는 PC통신이라는 이기가 있었다. 한마디로 퍼스널컴퓨터로 통신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당시로선 신세계였다. 아마 1990년대였으리라.
#1. ‘모뎀(modem)’. 혁신적 기술의 집합체. PC통신의 중추. 이것은 각 가정의 건넌방에 똬리 튼 전국의 ‘울트라 마니아’들이 가상세계에 접속하는 통로다. 이 물체를 전화선에 연결하면 작동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뚜뚜 띠∼∼∼’ 하는 조악하고 신경질적인 접속음이 들리는 순간, 나는 짜릿해졌다. 영화 ‘매트릭스’ 속 네오가 돼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갔던 것이다.
#2. 얼마 전, 밴드 ‘줄리아 하트’의 멤버들을 만나 대화하다 PC통신 이야기가 나왔다. 정밀하게는 하이텔 ‘모소모’(모던 록 소모임) 이야기다. 소모임이라는 타이틀에서 짐작할 수 있듯 상위 카테고리가 있었다. 하이텔 메탈동(메탈 동호회)이다. 모던 록이 메탈의 부속이었다니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모소모는 그렇게 본의든 아니든 훗날을 도모하게 된다.
#3. 모소모는 겸손한 어감과 달리 과연 한국 록계의 조용한 테러 집단이 돼갔다. 장르로 치면 헤비메탈과 하드록 위주, 또 앨범을 낼 정도의 프로가 아니면 공연에서는 대체로 외국 유명 밴드의 곡을 카피하는 것을 주로 하기 일쑤이던 기존 한국 언더그라운드 록 밴드의 양태를 바꿔 놨다. ‘모소모’ 회원이던 이석원 씨는 악기 하나 다룰 줄 몰랐지만 ‘왠지 나만 밴드 안 한다고 하면 꿀릴까봐’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밴드를 하고 있다”고 둘러댔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 실제로 ‘언니네 이발관’을 결성해 훗날 한국 인디 록의 전설이 됐다. 김민규 씨도 ‘U2. R.E.M. 스타일의 음악을 같이 할 멤버를 구한다’는 공고를 모소모에 처음 올렸다. 윤준호 씨가 여기 응해 ‘델리 스파이스’가 만들어졌다. 또 다른 회원 윤병주 씨는 ‘노이즈 가든’의 그 사람이다. 이 팀은 1994년 제1회 톰보이 록 콘테스트에서 10분 넘는 ‘타협의 비’를 연주해 대상을 차지한다.
#4. 그렇다면 이렇듯 인류 발전의 방향타를 바꾼 모뎀이란 과연 무엇인가. 좀더 들여다보자. 직류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으로 보낼 수 있는 교류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고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건 건넌방 사람들이 몰라도 좋다. 분명한 것은, 안방에서 전화를 쓰고 싶을 때 건넌방 모뎀이 연결돼 있으면 통화 중이 되며, 모뎀을 너무 많이 쓰면 가구주 내외에게 혼쭐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건넌방 사람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됐다.
#5. 후일담이랄까. 노스트라다무스 씨는 틀렸고 1999년은 지나갔으며 세월은 30년 가까이 흘러 현재에 이르렀다.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세계를 좀더 조용한 곳으로 만들었다. 온라인 콘서트가 유행이다. 무대를 설치하는 대신 집에서 악기를 들고 마이크 앞에 앉는다. 며칠 전에도 가수들의 릴레이 온라인 콘서트를 보면서 기분이 묘해졌다.
#6. 이제 구식 모뎀 따위는 필요 없다. 안방의 눈치를 볼 일도 없어졌다. 소모임 시절 사람들은 하나둘 스스로 안방을 차지하거나 가구주가 되기도 했다. 한편으로 어두운 곳에서는 기술의 발달이 범죄의 진화를 추동하기도 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버 성범죄와 사기가 횡행한다. 하지만 밝은 곳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세계가 생겼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의 홍수 속에 하루하루를 산다. 활자 하나에 목숨을 걸던 시절은 지나갔다. 날마다 수억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가상세계를 통행한다.
#7. 지하철을 탈 때마다 플랫폼을 메운 똑같은 자세의 사람들을 본다. 고개를 앞쪽으로 30도쯤 기울이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전철이 한강 위를 달릴 때도 이 사람들은 좀체 고개를 들지 않는다. 그게 왠지 좀 섭섭하기도 하다. 그래도 간절히 바란다. 각자의 창에는 아름다운 일만 가득하기를. 오늘도 라테가 참 달다.
임희윤기자 i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