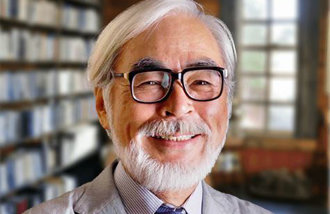그날 딸의 일기는 다른 때보다 조금 길었다. 엄마에게 “오늘 집에 내려간다”고 전화했는데 좀체 못 알아듣는 눈치. 통화가 끝나고 또 전화가 걸려온다. “온다는 게 오늘이니?” 그날 딸이 남긴 일기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역시 엄마가 이상하다.”
평범했던 가정에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왔다. 처음엔 아버지도, 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이는 치매 당사자. 자신이 이상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내가 노망이 났다! 짐만 되고 죽어야지”를 반복하며 울부짖었다.
어머니의 치매로 좋든 싫든 삶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가족. 딸은 상황을 부정하고 회피하기보다 차라리 ‘웃픈’ 상황들을 영상일기로 남겨보기로 했다. 몇 년이 흐르고 맞은 2017년 새해. 평소 자학 개그를 좋아하던 어머니는 딸에게 “올해는 치매니까 잘 부탁합니다”라는 새해인사를 덕담(?)처럼 건넸다. 딸이 찍은 영상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돼 2018년 상영됐다.
책은 딸이 아버지와 함께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돌보며 기록한 유쾌한 간병기다. 저자는 2007년 자신의 투병기를 셀프 다큐멘터리로 기록한 프리랜서 영상감독. 영상에 담지 못한 순간과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며 그가 느낀 감정을 담담히 글로 풀어냈다. 평소 식칼 한 번 잡지 않은 90대의 아버지가 아내를 위해 가정주부로 변신한 모습과 부모의 시시콜콜한 말싸움이 정겹게 그려진다.
저자는 한발 물러선 시각에서 이를 관조한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에 공감하다가도 “치매는 엄마를 서서히 변모시켜 감으로써 긴 이별을 준비하게 해주는 ‘신의 친절’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머니는 이후 병세가 심해져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저자는 감정의 과잉에 빠지지 않고 담담히 가족애를 말한다. 자신들도 서로를 늘 아껴온 가족이었음을…. 중증 치매인 어머니는 지금도 딸이 병실을 찾으면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른단다. “나오코!”
김기윤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