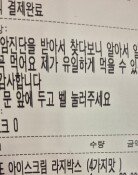“콜 집권 16년 후 나라는 마비됐다. 여당은 피를 철철 흘리며 스캔들로 휘청거렸고 경제와 노동시장, 사회보장 시스템은 깊은 위기에 빠졌다. 당시 독일은 ‘유럽의 병자’였다. 그때 동독 출신의 한 여성 정치인이 나타나 서독에 전환점이 됐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68).
16년 동안 총리로 재임하며 독일은 물론 서구 사회를 이끈 지도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란 찬사가 잘 어울렸던 그는 지난해 스스로 총리직을 내려놓으며 한 시대를 매조지었다. 책의 부제처럼 ‘독일을 바꾼 16년의 기록’이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일지도.
독일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볼 때, 메르켈은 여타 정치인과는 너무나 결이 다르다. 화려한 연설도 강력한 리더십도 없지만, 굳건한 인내와 누구라도 타협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했다. 어떤 정책을 다룰 때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반영하는 자세는 특히나 돋보였다.
운도 따르긴 했다. 상상해 보라. 만약 남북이 통일된 뒤 무명의 북한 여성 과학자가 남한 주도 사회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당시 독일 정치계는 동독 출신 여성이란 비주류 신인을 ‘마스코트’ 삼고자 메르켈을 과감히 등용했다. 단지 그들은 몰랐을 뿐이다. 메르켈은 토사구팽 될 이가 아니었다. 온화한 미소 뒤로 숱한 정적을 제거하는 결단력, 정치적 토대가 없는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우위를 잡는 영민함까지 갖췄다.
물론 저자는 호평에만 머물진 않는다. 너무 심사숙고해 결정은 언제나 뒤늦은 편이었다. 원칙이 없는 듯 상황 따라 입장을 자주 바꿨다. “직선제였다면 재선도 불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처럼 비전을 보여주는 카리스마도 부족했다. 하지만 우린 안다. 섣부른 선택과 꽉 막힌 옹고집과 현란한 언변이 그간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또 다른 앙겔라 메르켈이 세상에 계속 나와 줘야 하는 이유다.
정양환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