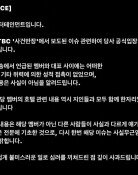196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도에는 조기 떼가 몰렸다. 해마다 4, 5월이면 연평도 바다엔 조기가 넘쳐났고, 거대한 조기 떼의 “꾸욱꾸욱” 울음소리에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였다. 작은 섬에 만선의 꿈을 쫓아온 선원 수만 명이 몰렸다. 조기 판 돈이 섬에 흘러넘쳐 상점과 유흥주점은 활황을 맞았다. 서울 명동 부럽지 않았다는 추억담까지. “연평도 어업조합 일일출납액이 한국은행 출납액보다 많았다” “연평도 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황해도 도지사 안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황금 시기’였다.
하지만 조기 어업량이 줄면서 호황의 불빛은 꺼졌다. 꽃게잡이가 조기를 대신하긴 했지만 과거만큼의 활력을 찾아보긴 어렵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연평도는 분단의 긴장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됐다. 연평도에 관찰 조사를 나가는 저자는 그 변화를 이렇게 말한다. “연평도는 하나의 군사 요새다. 주민의 절반은 군인과 그 가족들이다.”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의 얘기를 담은 ‘물고기 인문학’이자 ‘어촌 인문학’ 저서. 동해, 서해, 남해, 제주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전역의 바다를 발로 뛰며 조사한 내용과 지역 주민의 인터뷰가 생생하게 담겼다. 잡히는 어종의 변화에 따라 어촌의 모습도 시나브로 바뀐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싸인 만큼 어종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어촌 사람들의 희로애락도 다채롭고 풍성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