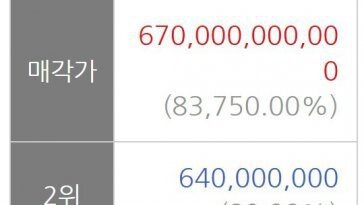젊은 여성, 특히 직장 여성들은 요즘 자기 몸을 가꾸고 다듬는 것에 온갖 정성을 쏟는다. 덩달아 ‘에스테틱(Aesthetic)’이라고 불리는 각종 피부관리업소와 네일케어, 체형관리, 모발관리 등 ‘뷰티족’들을 상대로 한 각종 ‘케어산업’이 강남과 명동 일대를 중심으로 번창일로에 있다.
이들 미용관리 업소들의 주고객층이 과거 연예인이나 40대 이상의 부유층 등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여유를 갖춘 커리어우먼들로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
‘뷰티족’이 급증하면서 월급날이 낀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이면 서울 강남역과 신사동 일대, 명동 일대의 각종 미용 관련 업소들은 젊은 직장여성들로 큰 혼잡을 빚는다.
역삼동 ‘뉴욕 에스테틱살롱’ 손정옥원장은 “5년 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인근에 이런 업소가 거의 없는 데다 손님들도 기혼여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20, 30대 직장여성이 고객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강남 지역의 경우 피부관리는 1회에 5만∼10만원, 손톱이나 핸드케어에 5000∼2만원, 머리관리에 10만∼20만원이 드는 데다 체형관리까지 받게 되면 비용은 한차례에 최소한 20만원을 넘는다.
하지만 ‘외모가 곧 경쟁력이자 자신감’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젊은 여성들은 이 같은 관심을 사치나 허영이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담동 L피부과의 에스테틱을 찾은 직장인 정모씨(29·여)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뾰루지 하나만 나도 신경이 쓰일 때가 많다”며 “친구나 동료들 사이에서도 능력 없는 여자가 가꾸지도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허영인가 자기개발인가
젊은 여성들의 이 같은 ‘뷰티신드롬’을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는 ‘허영심의 대중화’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름다움의 개념이 바뀌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굳이 부정적으로 볼 현상만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고려대 심리학과 성영신교수는 “외적인 아름다움은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타고나지 못하면 ‘팔자’대로 살거나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꾸기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되면서 미의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교수는 “자칫 외모에 대한 관심이 천편일률적인 유행을 무비판적으로 뒤따라가는 식이라면 오히려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감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MLB 포토]뉴욕 Y 지터 개막전 수난](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3/04/01/689067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