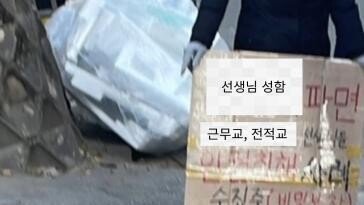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의 소식지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이창조씨는 얼마전 절친한 친구인 MBC 연보흠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씨가 참여연대의 소식지 참여사회 2월호에 쓴 편지에 연보흠씨가 ‘화답전화’를 해온 것. 이 편지에는 같은 대학을 다니며 사회현실을 고민했고 이제는 인권운동가와 기자라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된 두 친구 사이의 따뜻한 우정과 날카로운 비판이 씌어 있었다.
“보흠이가 명예훼손 아니냐고 하더군요.(웃음) 대학 다닐 때 서로의 집을 여관처럼 들락거릴 정도로 친했죠. 그 친구같이 똑똑하고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NGO 기자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수많은 단체간에도 개성이 느껴진다. 그중 인권운동사랑방은 좀 과격한 쪽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달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요구하며 혹한 속에서 단식운동을 벌이던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이창조 편집장을 처음 만났다. 13일 동안의 노상단식농성을 통해 4명이 탈진해 쓰러졌고 9명이 링거액을 맞았던 격렬한 농성이었다.
그때 단식농성단의 일원이었던 이씨는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단호했던 만큼 기자로서의 오기는 더 자극을 받았고, 몇 번의 시도가 반복된 끝에 20일 겨우 이씨를 만날 수 있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도 세미나와 MT는 빠진 적이 없었죠. 세미나에는 뒤풀이가 있기 때문이었고 MT는 부모님께 보고하지 않고도 밤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죠.”
실제의 이씨는 집회현장에서 볼 때처럼 딱딱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그 사람들이 ‘민중’이라는 단어로 다가와 인권운동을 하게 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졸업학기에 쓴 리포트 제목이 ‘노동과 인권’이었어요. 그 글을 쓰다가 인권운동사랑방을 알게 됐지요. 그후 졸업을 1달 앞둔 96년 겨울에 사랑방에 찾아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이씨가 편집하는 인권하루소식은 NGO 단체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한 소식지가 돼 있다.
작년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는 민주시민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이 소식지는 그날그날 쟁점이 되는 인권관련 소식을 정리해 구독자에게 메일로 배달한다. 인권운동가이자 사랑방 대표인 서준식씨의 ‘보안관찰법 거부’도 이 소식지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사실 보안관찰법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큰 법입니다. 이미 실형을 마치고 사회인이 된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며 감시하게끔 하는 법이지요. 이 법에 의해 서준식씨 같은 공안사범은 3개월에 한번씩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서준식씨는 이 법을 일부러 지키지 않는 저항운동을 하고 있어요”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이라는 소설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다.이 소설의 주인공은 감옥에서 풀려나 시골로 내려가는데, 그곳 경찰이 찾아와 근황을 묻는 장면이 나온다. 그게 보안관찰법에 의한 조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난 6일 서준식씨는 보안관찰법 등 위반으로 서울지법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국가기관에 대항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그점에서 최근 민주당이 국회에 입안한 인권위원회법을 그는 자격 미달로 보고 있다.
“국가권력의 대표적 행사기관이 검찰, 경찰, 교도소 같은 곳이죠. 이곳에서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번 민주당이 입안한 법안에는 이 같은 인권침해를 견제할 힘이 없어요. 가령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침해한 검찰을 소환해도 검찰이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정도밖에 안 되죠. 게다가 이미 수사가 끝난 사건에는 인권위원회가 손을 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씨를 보면서 90년대 내내 쏟아졌던 이른바 '후일담'소설이란 게 의심스러워졌다. 이씨가 친구에게 썼던 편지에서처럼, 과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면 그것을 괴로워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갚아나가야 할 것인가?
"작은 것들만 이야기하다보면 우리 이야기는 못하고 말죠. 작은 것들이 우리를 말하지 못하게 했던 게 90년대의 이데올로기 아니었을까요?"
둘만 있던 사랑방 사무실에 막 명동성당 집회를 마친 사랑방 식구들이 밀려 들어왔다. 이씨는 동료들에게 집회상황을 묻고 이것저것 할일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후일담은 그곳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안병률/ 동아닷컴기자mokdong@donga.com
NYT >
-

데스크가 만난 사람
구독
-

사설
구독
-

기고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NYT 한국경제위기 보도 요약]](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