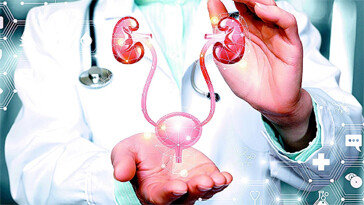한마디 한마디가 힘겹다. 손도 발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13년 동안 동아일보를 배달하며 동아일보에 ‘인생을 걸었다’는 이 장애인의 눈빛에는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동아일보를 아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강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불편한 몸으로 150부 돌려
경기 안산시 본오동 동아일보 본오지국에서 배달과 독자 관리를 맡고 있는 지역장 이욱희(李旭熙·35)씨. 선천성 뇌성마비 3급 장애인인 이씨는 86년 고교 졸업 후 일자리를 구했으나 고교 때 배운 용접기술을 선뜻 사준 곳은 없었다.
그래서 88년부터 시작한 일이 동아일보 신문배달. 아무도 자신이 장애인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새벽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왜 하필이면 동아일보였느냐는 질문에 이씨는 “신문은 동아일보밖에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당시 신문 1부를 한달간 배달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700원. 어설픈 걸음걸이로 그가 돌릴 수 있는 최대 부수가 130부 정도였으므로 한달에 손에 쥔 돈은 9만1000원이었다.
“그, 그, 그래도 조, 좋았어요. 아, 아, 아무도 나, 나를 돌봐주지 아, 않을 때 도, 도, 동아일보만이 저, 저에게 일자리를 주, 주었거든요.”
신문배달을 시작한 지 10년만인 98년 그는 배달원 딱지를 떼고 군자지국의 정식 직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지역장’인 그는 아직도 매일 오전 1시 지국에 나와 수천부의 신문에 간지를 끼우는 삽지(揷紙)작업을 하고 또 150여부의 신문을 직접 돌린다. 남들의 절반 속도밖에 안되는 걸음걸이여서 그는 항상 ‘뛰어다녀야’ 한다.
▽노부모 모시며 조카 키워
동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그의 비상한 기억력과 끔찍한 가족 사랑. 더듬거리는 말투로도 매월 40∼50명의 독자를 새로 확보하는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1500명 독자의 이름, 첫 구독일, 첫 수금일, 미수금액을 줄줄이 다 외고 있다.
이씨는 그 비결을 “그냥 오래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겸손히 말했다. 하지만 동료들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귀띔해준다.
이씨의 효심과 조카 사랑도 남다르다. 월급 130만원으로 노부모를 모시며 가장노릇을 하는 그는 부모가 없는 두 조카의 교육과 생계도 떠맡고 있다. 두 조카의 아버지인 이씨의 동생이 97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제수도 같은 해에 가출해 버렸기 때문.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지국장이 이씨에게 다른 사람보다 후한 월급을 주겠다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동정은 싫다. 내가 하는 일만큼 받겠다”는 것이 이유.
“살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이씨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도, 독자들이 도, 도, 동아일보 구, 구독을 사, 사절할 때죠. 그, 그럴 때는 내 사, 사, 살점이 떠, 떠, 떨어져 나가는 것 가, 같아요.”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농구 포토]“림 부러질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3/01/06/688266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