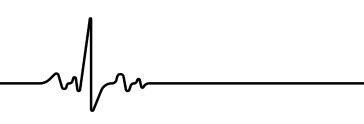‘검사 최경원(崔慶元)’ 역시 마찬가지였다.
99년 5월 법무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가 2년 만인 24일 법무장관이 돼 친정으로 돌아온 최 장관. 그는 지난달 15일 발간된 검찰내부 소식지 ‘부내 회보’를 통해 3년차 변호사로서의 소회를 특유의 미려한 문체로 피력했다.
‘공직의 길, 공직 밖의 길’이라는 제목의 특별기고 서두에서 그는 만 30년의 검사 생활을 회상한 뒤 ‘초보 변호사’로서 느낀 생각을 털어놨다.
“가끔 당황하게 되는 것은 같은 사안을 놓고 검사와 변호사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사례들을 접할 때입니다.” 완곡한 이 한마디에는 자신이 검사시절 무심코 대했던 변호사 선배들에 대한 미안함이 배어 있는 것 같다. 후배 검사와 의뢰인 사이를 오가는 역할 역시 쉽지는 않았던 것일까.
“후배들의 얼굴을 보면 현직을 떠나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속된 말로 변호사 다 됐구나 하는 실망스러운 표정이 완연하고 의뢰인들은 아직도 자기가 검사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 장관은 나머지 글의 대부분을 후배와 조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 할애했다.
“법무 검찰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왜 그런지 마음이 쓰이고 아무리 변호사라 해도 검찰 후배들이 곤란해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어 최 장관은 ‘후배들과 자리를 함께 할 때가 마음이 편하고 대화도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을 법무 검찰 가족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농구 포토]“림 부러질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3/01/06/688266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