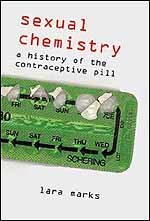
여성에게 ‘원하지 않는 임신’이란 공포에서 벗어나 성적 자유를 제공해준 것이 피임약이다. 이것이 여성에게 스스로 임신을 선택하는 권리를, 사회에는 사회안정의 기본인 인구조절의 기회를 제공했다.
런던대에서 약학사를 가르치는 저자는 이 책에서 먹는 피임약의 개발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역사를 되살려 놓았다.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2차 대전후 빛을 보게 된 피임약의 탄생에는 힘든 산고의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임약이 미국에서 사용허가를 얻은 것은 불과 40여년전인 1960년이었다. 전후 피임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만든 동인은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인도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개발 초기에 피임약은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고 시장으로 직행했다. 여기에는 지금보다도 수 십배나 많은 합성 에스트로겐(에치닐에스트라디올)이 함유되어 있어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 점에 대해서 저자는 제약회사의 패덕을 문제삼기 보다는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온정론을 보여준다. 1956년 푸에르토리코를 시작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임상실험을 실시했지만 엄정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제대로된 분석결과를 얻기에는 불가능했다는 이유를 든다.
탄생 이후에도 피임약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에는 적잖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지금 RU-486 등 ‘사후’ 피임약 허가가 논란이 되듯, 당시 미국사회에서도 피임약의 보급은 만만찮은 사회적 저항에 부딪쳤던 것이다. 대표적인 반대파가 출산조절을 인종주의로 받아들인 흑인운동권와 ‘생명 존엄론’을 들고나온 카톨릭계였다.
저자가 파악하기에 피임약 수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등공신은 미국의 중산층 여성이었다. 당시 여권 신장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이들이 피임약을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발매 초기에는 개발도상국이 인구조절을 위해 이 약을 보급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쌌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것은 피임약이 암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방지하는지를 둘러싼 의학계의 논란, 피임약이 에이즈 확산에도 일조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원제 ‘Sexual Chemistry: A History of the Contraceptive Pill’
<윤정훈기자>digana@donga.com
TV속 그곳 : 술집 >
-

e글e글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TV속 그곳/술집]60~70년대 Old Rock의 '메카' 올드락](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