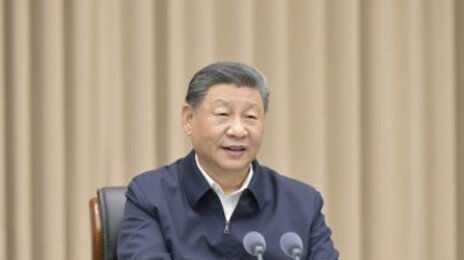▼계파정치는 집권 초기에나▼
물론 미국에서도 대통령과 같은 주 출신의 인물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지미 카터 이래로 대통령의 출신 주에 따라 조지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칸소 등의 ‘특정지역 사단’이 정책 결정의 주도세력이 되곤 했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권력의 핵심에 두는 것은 미국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그러나 백악관 보좌진이나 내각에 부분적으로만 포진되었던 미국의 역대 지역사단을 한국정권의 지배 계파에 비유할 수는 없다. 오늘날 여권의 ‘동교동계’는 김근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권력의 사유화(私有化)’란 표현을 쓸 정도로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핵심 고위직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 수준의 실무직과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의 인사도 동교동계가 좌우한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미국의 경우가 우리에게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지역적 정치사단’은 선거 기간과 정권 초기에나 권력을 향유할 뿐이라는 점이다. 고도의 선거 전략을 수립·실행하거나 집권 초의 과도기에 정권의 안정을 기한 후에는 미국 대통령의 측근사단은 그 유용성을 잃게 돼 전면에서 사라진다.
일단 국정이 궤도에 오르면 더 제도화된 정치가 대통령 개인에 의한 사단정치를 대체한다. 특정 사단이 일방적으로 이끌 만큼 미국의 정치체제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그 측근에 의한 정국 운영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분출되는 갈등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 그에 따라 체제 작동의 위기 증후군이 나타날 때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개인적 계파가 아닌 제도의 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들 수 있다. 임기 초에 그의 주위에는 일단의 아칸소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꼭 아칸소 출신이 아니더라도 클린턴 부부의 개인적 네트워크에 들어 있는 정치인들이 정책 결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클린턴의 측근 정치는 2년 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클린턴은 더 공식화된 제도의 틀에서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는 공화당원 전력(前歷)의 딕 모리스를 최고 참모로 영입해 중도정책을 표방했다. 측근정치에서 제도정치로 전환함으로써 클린턴은 재선에 성공했고 개인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동교동계라는 대통령 측근세력은 정권 후반기인 요즘에도 인사와 정책 결정을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동교동계에 대한 몇몇 민주당 최고위원과 소장의원들의 비판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서 나왔을지는 몰라도, 소수의 특정 계파가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건재를 과시하며 권력을 누려왔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오랫동안 대통령과 동고동락하며 투쟁해 온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이끌고 정권교체 초기에 대통령 곁에서 국정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측근정치가 고착화해 집권기간 내내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난국 면하려면 제도 정치를▼
국정수행은 야당 시절의 투쟁이나 선거와는 다르다. 이질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거나, 적어도 수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효과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하다. 대통령 개인의 측근 계파는 강한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국정 수행에서 다양성과 민주성을 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제도화된 틀을 구축해 계파와 상관없는 제도정치를 펼쳐야만 복잡한 사회갈등을 흡수하고 국정 난국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클린턴이 측근정치를 더 빨리 청산했다면 중간선거에서 그처럼 참패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임성호(경희대 교수·정치학)
황희연의 스타이야기 >
-

오늘의 운세
구독
-

우리 동네 응급실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황희연의 스타이야기]기린을 닮은 여자, 장만옥](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