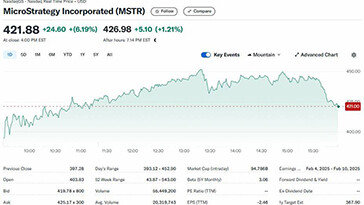대학 1년 때 백지 상태에서 처음 읽었던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그리고 시작된 남독의 몇 년, 군대시절 몰래 건빵주머니에 시집을 넣어 다니면 읽든, 읽지 못하든 내 허벅지는 로보캅처럼 단단해졌었다.
유년시절 구로공단 부근 파란대문 집을 생각한다. 염색공장까지 길게 이어지던 개나리담장, 그 길을 따라 출근했다가 얼굴이 노랗게 물들어서 귀가하던 셋방 누나들, 항상 먼 곳으로만 돈벌러 떠나시던 아버지. 그 모든 아픔에 대해 여전히 나는 겨우 짐작만 할 뿐이다. ‘고통스러운 것들은 저마다 빛을 뿜어내고 있다’는 한 시인의 시를 생각한다.
언제나 타인의 고통은 내게 두눈 뜨고도 읽을 수 없는 점자와 같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만질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싶어했다. 캄캄하던 시절 혹 그런 것이 시의 육체가 아닐까 생각했었다. 갓난아이의 꼭 쥔 주먹 같은, 땅바닥에 박혀있는 돌멩이 같은 태초의, 고통의 냄새가 나는 ‘우리나라 글자’가 나는 좋았다. 그것은 체험의 깊이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차제에 한 번 더 명심해 둔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얼음벽돌집을 짓고 그 속에서 숨죽이며 있느라 미처 고백하지 못했을 뿐. 위태로운 내 사랑의 영토. 그곳 성소(聖所)의 주인이신 할머님, 큰 스승이신 할아버님, 부모님과 여동생, 두 분 이모님, 일하 삼촌, 진무, 진서,‘북어국을 끓이는 아침’에 동기들, 문학회 식구들에게 특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부족한 글을 뽑으며 망설이셨을, 사숙하던 선생님들께 꼭 좋은 글로써 보답하고 싶다. 겨우 시작인 것이다.
△1977년 서울 출생 △현재 단국대 공학부 3년 재학
◆ 2002년 동아 신춘문예 당선작 및 가작 전문(全文)은 동아닷컴(http://www.donga.com/docs/sinchoon/)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