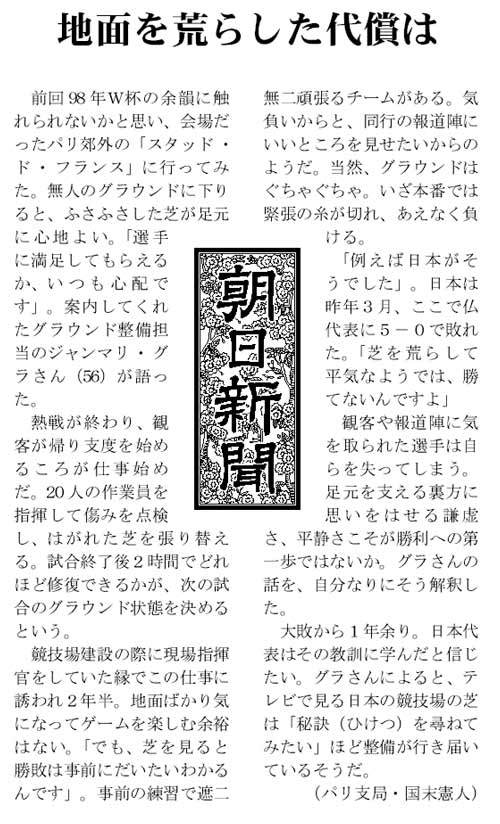
▼그라운드를 망친 대가는
지난번 대회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의 여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파리 교외에 있는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을 찾아봤다. 아무도 없는 그라운드로 내려가니 푹신푹신한 잔디가 기분좋게 발밑에 밟힌다. “선수들이 만족할 것인지가 늘 걱정입니다.”안내를 해준 그라운드 정비담당 장마리 그라(56)의 말이다.
열전이 끝나고 관객들이 돌아갈 채비를 할 때부터 일은 시작된다. 20명의 인부를 지휘해 손상된 부분을 점검하고 잔디가 떨어져 나간 곳에는 새 잔디를 깐다. 시합이 끝난뒤 두시간 이내에 어느정도 복구하느냐에 따라 다음 시합의 그라운드 상태가 결정된다고 한다.
경기장을 건설할 때 현장감독을 한 인연으로 이 일을 맡은지 2년반. 잔디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게임을 즐길 여유는 없다. “하지만 잔디를 보면 승패는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시합전에 무턱대고 열심히 연습하는 팀이 있다. 함께 온 보도진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라운드는 엉망진창. 막상 본시합에 나가면 긴장이 풀려 어이없이 져버린다.
“바로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여기서 프랑스 대표팀에 5-0로 패했다. “잔디를 엉망으로 만들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이길 수가 없지요.”
관객이나 보도진에 관심을 빼앗기면 선수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만다. 오히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발밑을 받쳐주는 ‘숨은 것’에 대한 겸허함과 평상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제일보가 아닐까. 그라씨의 말을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했다.
대패하고 난뒤 1년여. 일본대표가 거기가 무엇인가를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그라씨에 따르면 TV로 본 일본내 경기장의 잔디는 ‘비결을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정비가 잘 돼 있다고 한다.
구니스에 노리토 파리지국
정리〓심규선 도쿄특파원 ksshim@donga.com
밀레니엄 담론 >
-

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구독
-

교양의 재발견
구독
-

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밀레니엄 담론]자본주의여, 인간의 얼굴을 보여다오](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