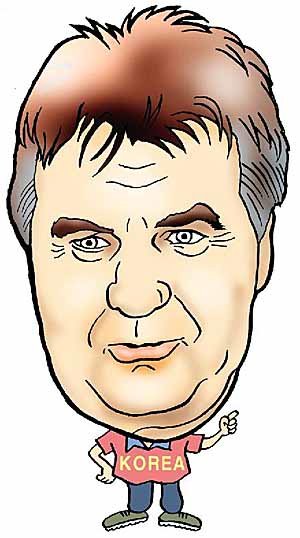
경제계에서는 이미 ‘히딩크 리더십’이나 ‘히딩크식 경영’이 화두(話頭)로 떠올랐다. 주요 기업들은 경제연구소 등에서 만든 분석 리포트를 임직원에게 돌렸다. 우리 사회의 ‘냄비 기질’에 대한 비판도 일부 나오지만 ‘패배 의식에 젖은 평범한 고교생을 잘 가르쳐 명문대에 합격시킨’ 지도력에 대한 찬사와 벤치마킹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
히딩크 리더십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평범한 진실을 많이 담고 있다. 오히려 기상천외한 발상은 찾기 힘들다.
그는 연고(緣故)나 ‘이름’을 무시하고 실력과 헌신성, 열정과 패기만을 잣대로 대표팀을 구성했다. 과거 선발 기준이라면 태극마크를 달기 어려웠을 ‘포르투갈전의 영웅’ 박지성을 비롯해 송종국 김남일 이영표 등은 자기 몫을 톡톡히 해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능력 위주 인사가 말처럼 쉽지 않다. 유능하다고 알려진 사람조차 실제 같이 일을 해 보면 허명(虛名)에 불과한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실력과 성실성이 부족한 사람이 연줄이나 ‘정치력’으로 출세할 때 조직은 곪기 시작한다. 옥석(玉石)을 무시한 ‘편중 정실 인사’가 우리 사회의 각 부문을 흔들어놓아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겼는가.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요즘 팀워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어떤 조직이든 ‘스타’는 키워야 한다. 그러나 전체 전력(戰力)에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다. 팀이 진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보다 이긴 경기에서 벤치를 지킨 선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전원 공격, 전원 수비’의 ‘토털 사커’는 다른 조직관리에도 적용된다. 개인 경력에만 신경 쓰면서 조직의 승패에는 무관심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궂은 일을 외면하는 임직원 중용(重用)은 대체로 잃는 것이 더 많다.
히딩크 리더십은 또 최고경영자(CEO) 등 리더의 귀가 너무 여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충분히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기만 하면 ‘결정의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대의 CEO로는 낙제점이다. 자신감을 갖고 선택한 뒤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감독은 지시자가 아니라 먼저 뛰는 동료”라는 말도 곱씹어 볼 점이 많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온 몸을 던지고, 리더는 그런 사람에 주목하라. 그리고 달콤한 성취의 희열을 함께 느껴 보라.’ 내일 사상 첫 8강 도전에 나서는 히딩크호(號)의 성공이 한국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닐까.
권순활 경제부차장 shkwon@donga.com
메트로 25시 >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메트로 25시]24시간 사우나/직장인의 '원기 충전소'](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