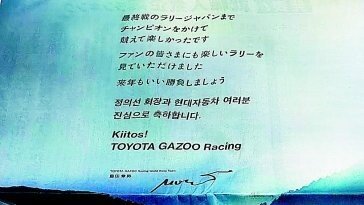당신은 내 것이 아니지만 나는 당신 것이니께, 입술하고 손가락으로 도장 찍으이소. 그래 안 하면….
그래 안 하면 우짤긴데?
안방으로 날아든 노란 나비가 이불 위에서 하늘 하늘 오르내리고 있다. 나비도 남자의 땀냄새를 아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틀림없이 암나비겠지. 여자는 느릿느릿 속치마를 입고 적삼을 걸치고, 넋이 나간 듯 일어나 구깃구깃 구겨진 파란 치마를 몸에 둘둘 말고서 치마끈을 가슴 위에 겹쳐 묶고, 저고리를 입고 고름을 맸다. 그리고 여자는 거울 속으로 들어가려는 나비를 무시하고 비단 쪼가리를 입에 물고 머리를 뒤로 땋았다. 붓으로 입술 윤곽을 정성껏 그리고 연분홍색 연지로 입술을 물들이자 나비가 미친 듯이 날개를 거울에 부딪쳐, 노란 인분이 거울 표면으로 미끌어떨어졌다.
여자는 치마 자락을 잡고 비에 젖은 영남루 돌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여자가 달아오른 몸을 영남루 난간에 기댈 즈음, 하늘은 검붉은 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밀양강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지라기를 깨거나 미나리를 뜯던 여인네들도, 은어를 낚던 남정네들도, 씨름을 하던 남자아이들도 공기놀이를 하던 여자아이들도, 강둑에 걸터앉아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던 노인네들도 모두 비가 밀양강을 건넜을 때 집으로 돌아갔다.
여자 혼자였다. 배다리가 삐걱 삐걱 흔들릴 때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종남산 꼭대기에 하얀 보름달이 떠올랐다. 저녁 어둠 속, 배다리 쪽에서 늙수그레한 두 여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둘 사람 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한 사람은 무언가를 껴안고 있다. 애기? 아니, 애기가 아니다. 늙은 여자들은 하양과 감색 치마를 펄럭이면서 영남루 돌계단에 발을 올려놓았다. 그 여자의 어머니다. 운하 목욕탕에서 욕탕에 몸을 담그고 얘기한 적이 있으니 틀림없다. 또 한 사람은, 그 여자의 배를 뛴 부선 아줌마다. 뭘 껴안고 있는 거지? 짚으로 싸서 양 끝을 새끼줄로 묵었다. 오라, 오늘은 아기가 태어난 지 사흘 째, 태반을 떠내려보내는 날이다.
글 유미리
이라크 파병 : 보상 >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우아한 라운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가상화폐 급등으로 다시 주목받는 ‘비트코인 창시자’[피플 in 뉴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502068.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