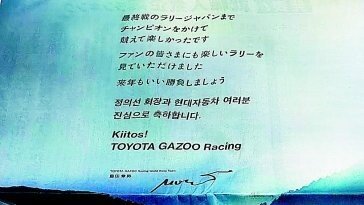나는 그 아이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였다. 칼이나 끝이 뾰족한 것은 바늘 상자에다 숨겼고, 여름철에는 모기나 벌, 등에와 파리매에 물리지 않도록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였고, 얼굴을 긁어도 상관없도록 일 주에 두 번은 손톱을 깎아준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그 아이의 몸 속은 빨간 피로 물들어 있다. 흐르는 시냇물보다 한층 무거운 피의 흐름이 졸졸졸졸, 어김없이, 졸졸졸졸, 고임 없이.
나는 피의 지킴이다. 앞으로도, 삶과 죽음의 제방인 오직 한 겹 피부가 찢겨나가지 않도록 줄곧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내 목숨이 다한다면, 누가 그 아이의 피를 지켜줄까. 우철이?
그 사람?
그 사람, 내 오직 하나 뿐인 남편, 자식들의 유일한 아버지. 그 사람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게 아픔만 주고 있다. 우근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아픔을 견뎌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팔로 아기를 지키고, 이 팔로 아기에게 매달린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아픔 그 자체가 아니라, 아픔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아픔 이외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슬퍼하고 조심할 기력을 잃고 나는 아픔의 포로가 되었다. 아픔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아픔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아픔에 끌려 다닌다.
언제까지 끌려다닐지, 어디까지 끌려다닐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얼마 못 가 닳고닳아 아픔마처 없어질 것이다. 시신처럼.
그 사람과 그 여자는 내 머리 속 어둠에 내재해 있다. 어둠이 차가운 물처럼 머리카락과 등으로 스며들어도, 나의 증오에 비쳐져도 두 사람은 뒤얽힌 손발을 풀려하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고, 움직임에만 열중한다.
왜 왔던가 왜 왔던가 왜 왔던가
가마 타고 시집은 왜 왔던가
희향은 머리 한 구석에 있는 하얀 달 같은 증오심을 의식하면서 아리랑을 부르고, 얼굴을 길 쪽으로 돌렸다. 회오리바람에 흙먼지와 꽃잎이 휘날려 뿌연 유리문 탓인가, 길이나 오가는 사람들이나 이미 끝나버린 풍경처럼 흐리멍덩하게 번져 보인다.
글 유미리
이라크 파병 : 보상 >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구독
-

애널리스트의 마켓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