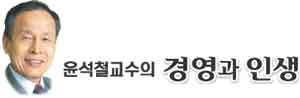
며칠만 굶으면 남이 가진 것을 뺏어서라도 입에 풀칠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나 농사를 지어 쌀 한 톨을 입에 넣으려면 88가지 일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 한자 쌀 미(米) 자는 ‘八十八’의 수직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삶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남이 가진 것을 강탈하기 위한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식량은 물론 토지, 건물,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노예로 쓰기 위해) 강탈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을 가나 높이 쌓은 성벽과 요새, 성채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는 무사의 투구 하나가 황소 세 마리 값이었고, 말 한 필이 암소 20마리 값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남이 가진 것을 뺏기 위해, 그리고 가진 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용 시설과 무기가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이다.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약육강식이라고 부른다. 밀림이나 바다 속 생태계에는 약육강식이 생존의 기본 양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약육강식에 식상한 나머지, 폭력이나 부당한 특권이 난무하지 않고 공정성(fairness)과 규범성(norm)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공정성과 규범성의 예는 운동경기에 잘 나타난다.
골프처럼 경기자 사이에 실력차가 있으면 실력이 높은 사람에게 핸디캡을 부과해 실력차를 제거한 후 경기를 하게 한다. 올림픽에서도 체격 차이가 승패를 좌우할 종목에서는 체급별로 경기를 하게 한다. 이것이 스포츠 세계의 공정성이다.
또 스포츠 세계에서는 엄격한 규범, 즉 룰(rule)을 만들어서 룰에 어긋나는 경기를 하면 예외 없이 제재를 받는다. 이처럼 공정성과 룰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사회가 ‘자유경쟁’ 사회다.
#왜 실존철학인가?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보다 더 유능한 자가 있으면 자기는 패자(loser)가 될 수밖에 없다. 자유경쟁 사회에서 패자는 하소연할 곳도 없다. 그러면 승자는 행복한가? 승자는 계속되는 경쟁에서 또 이겨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그 역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승자나 패자 모두 스트레스 혹은 좌절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곳이 자유경쟁 사회다. 그래서 자유주의 체제로 경제를 발전시킬수록 알코올 중독, 마약복용, 가정 불화, 높은 이혼율과 자살 등 사회문제가 많아진다.
실존주의 문학가 알베르 카뮈는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이 철학의 기본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주장하고 있다.
노벨상까지 받은 문호가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인간 사회의 부조리(不條理)에 대한 그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부조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삶의 세계에는 과연 부조리가 많은가? 카뮈에 의하면 “부조리란 인생에서 의미를 찾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인간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비합리성의 세계를 뜻한다”.
부조리는 부정부패나 불법행위와 다르기 때문에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요구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체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서 신망 받는 좋은 제품과 계속 증가하는 수요를 가지고 있던 건실한 흑자기업들도 은행측의 융자금 회수로 무수히 쓰러졌다.
동시에 ‘인생에서 의미를 찾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하나 저지른 일 없이) 실직 혹은 가정파탄의 고통 속으로 던져졌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무고한 백성들이 의미 없는 전쟁과 살육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희생되고 있는가?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삶의 세계를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외쳤고, 마르틴 하이데거는 ‘세계는 고뇌하는 인간에게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토록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삶의 세계에서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다음 글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자.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yoonsc@plaza.snu.ac.kr
아침을 열며 >
-

부동산팀의 정책워치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아침을 열며]역사의 아이러니](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