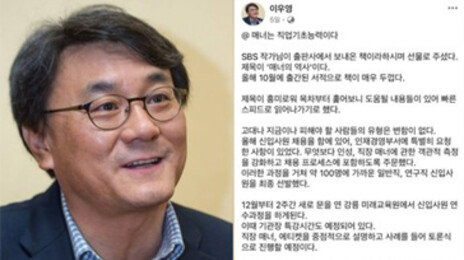한국과 일본은 독일과 폴란드의 교과서 협력에서 무엇을 배울까.
독-폴 간의 교과서 협력문제를 다룬 ‘국가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과서 개선’ 국제학술회의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열렸다.
폴란드 브로츨라브 대학의 크르시스토프 루흐니에비스 교수는 “1972년 서독-폴란드 공동교과서 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진행했다. 의견 차이가 가장 컸던 부분은 20세기 양국 관계사, 특히 전후 이민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토론은 2년동안 계속되었으며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몰고 간 적도 수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독일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반응도 공산주의 국가였던 폴란드보다 더 솔직했다. 서독 역사학자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전통깊은 독일의 역사를 팔아먹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반면 폴란드 역사학자들은 정부의 권력에 놀아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역사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은 이렇듯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1976년 역사 및 지리에 관한 ‘권고안’을 양국에서 마련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고안’의 출판이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권고안’을 활용하는 문제는 양국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연방주의적 국가구조가, 폴란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정치적 이유들이 활용을 저지했다. 그러나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은 매년 만나게 됨으로써, 상호이해를 위한 대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독일 게오르크 에케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의 로버트 마이어 상임연구원은 양국 교과서의 현 상황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는 “독일교과서는 폴란드,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에 대해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많은 교과서에서 게르만족의 동점, 폴란드의 분할,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면 폴란드에 대한 설명은 몇 줄 되지 않는다.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폴란드는 불쌍하고 희생당한 국가라는 상투적 이미지로 표현된다. 때로는 프로이센적 색채의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된다. 폴란드의 교과서는 다원주의적 관점의 사고에 바탕을 둔 역사기술에 생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국가의 명예를 위해 정확하지 않게 기술한다”고 말했다.
그는 “1976년의 ‘권고안’이 내용도 부족하고 1989년 베를린 붕괴 이후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아 최근에는 20세기 양국사에 대한 ‘교사지침’이 만들어졌다. 교재쪽보다는 교사지침을 통한 교육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연구소의 볼프강 횝켄 소장은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 정치인의 지원이 주요한 조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교과서가 서로 다른 엘리트 집단 또는 정파들 사이에 정치적 내분의 소재가 되는 한, 결실있는 작업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정치인들은 학술 및 교육계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이들의 자율적 작업을 보장해야 한다교과서 개선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바로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데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김순덕의 도발]‘이재명 리스크’ 민주당은 몰랐단 말인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39561.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