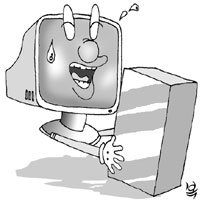
공짜지만 외면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또 현재 인터넷에서 돈을 지불할 마음이 생기는 콘텐츠를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대부분 ‘공짜라면 이용해 주겠다’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한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은 아마 ‘사람을 모으면 돈이 된다’는 ‘장사의 철칙’을 믿었기 때문이리라. 사람이 모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먹고 마시는 돈이 입장료보다 많을 때도 있다.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에 아이들을 데려간다면 놀이기구만 이용하고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 장난감이나 캐릭터 인형을 한아름 사게 돼 있다.
일본의 민영 철도회사들은 ‘사람을 모으면 돈이 된다’는 철칙을 가장 잘 실행하고 있는 기업에 속할 것이다. 전철역 구내에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은 기본이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역에는 틀림없이 철도회사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이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 백화점 중간층에 역을 만들어 승객이 역사 밖으로 나가려면 백화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곳도 있다. “보는 것은 모든 욕망의 근원”이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구조로 만든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들은 앞 다투어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람을 모았지만 수익을 올린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물리적인 공간에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팔기 힘든 구조라는 점이다. 기껏해야 ‘아바타’ 정도만 팔 수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을 모아서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는 본업이 아니라 부가적인 이익 창출의 도구일 뿐이라는 점이다. 야구장이건 테마파크건 전철이건 이용료를 내고 들어온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면서 한 번 더 장사를 하는 구조다.
결국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람을 모으면 돈이 된다’는 철칙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요즘 몇몇 포털사이트에서 유료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료화의 성공 여부는 돈을 지불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그 얘기는 다음주에….
김지룡 문화평론가
오늘과 내일 : 홍찬식 >
-

영감 한 스푼
구독
-

동아광장
구독
-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오늘과 내일/홍찬식]진정한 인디 문화가 그립다](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동아광장/송인호]빚더미 부동산 PF, 글로벌 기준 맞게 구조 개선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6489.1.thumb.png)
![[사설]손가락 잘리고 병원 15곳서 수용 거부당한 18개월 영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6649.1.thumb.jpg)
![“1초 스캔으로 잔반 줄이고 건강 지키는 마법”[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6662.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