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집에 책꽂이가 (붙박이 포함) 다섯 개. 구경시킬 사람도 없으면서 민망한 듯 드문드문 나눠 배치했지만, 이어 놓으면 만화책만으로 책꽂이 한 개 반을 거뜬히 넘길 거다.
마블과 DC의 슈퍼히어로 코믹스. 없어서 못 산다. 베놈이 등장한 '스파이더 맨' 3편(2007년)의 블랙 코스튬 티저포스터는 개봉 1년 전부터 개인 블로그에 올라가 있었다. 어색한 구석 없는 거미줄 액션을 스크린에서 처음 만난 순간, 진심으로 CG의 위대함을 찬양했다.
날개 달린 투구를 쓰고 해머를 휘두르는 '신의 아들' 슈퍼히어로라니.
어쩐지 공산품 같은 느낌의 DC보다 좀더 복작복작 인간적인 수공품처럼 보이는 마블 캐릭터들이 이따금 뜨악해지는 건, 바로 이분 토르를 비롯한 몇몇 직설적 인물설정 탓이다.

오딘 신의 아들 토르 역시 마찬가지. 초능력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그냥 압도적인 절대자의 아들이다. 적통을 이으려던 영광의 찰나 부친의 뜻을 거스르고, 그 벌로 지구에 떨어진 '신'. 어릴 때 만화나 동화에서 읽으면서도 현실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충분히 납득했던 이야기 속 캐릭터가, 1억 5000만 달러(약 1600억 원)를 퍼부어 만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실사 영화의 주인공으로 떡 하니 나타난 거다.

흥분보다는 염려가 앞섰다. '할리우드 산 우뢰매'가 되지 않으려나. 해머로 땅을 내리쳐 행성을 날려버리고 번개와 비바람을 마음대로 부리는 슈퍼히어로라니. 거미에 물린 고학생이나 크립톤행성에서 살아남은 외계인을 내세운 소박한 이야기와는, 차원이 많이 다른 소재다.
마블 캐릭터들의 아버지 스탠 리는 여기서 세 발짝쯤 더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이미 선보인 스파이더 맨, 아이언 맨, 헐크를 포함해 올해 스크린에 등장할 토르, 캡틴 아메리카 등이 한꺼번에 출연하는 '어벤저스'를 영화관에 걸겠다는 것.
태권브이와 황금날개가 한 만화영화에 등장했던 것만큼이나 흥분되는 소식이다.
우뢰매를 연상시킨 염려는 영화를 만난 즉시 사라졌다. 국내 개봉 3주 만에 누적 관객 수 164만 명. 북미 시장에서도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다.
2011년 세계 영화시장의 중심에 있는 소재는 틀림없이 슈퍼히어로다. 그리고 그 형상은 결코 애들용이 아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철두철미 어린이의 눈높이와 마음으로 작업해 독특한 품격을 빚어낸 것과는 양상이 다른 장인정신. 어느 쪽이든 '장난'은 아닌 거다.

휘황찬란한 상체근육을 가졌지만 얼굴이 낯선, 이름에서 햄스터가 연상되는 짐승남 주연배우를 잠시 치워 놓고, 그 주변을 살펴보자.
그 곁에 선 오딘 신의 아내는 르네 루소. 톱 자리에 서본 적은 없지만 B급이라고 할 수 없는 무게감의 배우다.
지구로 추락한 토르에게 한눈에 반하는 철부지 과학자는 올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자인 내털리 포트먼이다.

이쯤 되면 이건 '스타 배우들이 잠깐 쉬어가는 코너처럼 선택한 팝콘 무비'일 수 없다.
배우와 감독을 겸하는 지성파 스타로 1980년대에 각광받았던 케네스 브래너가 연출을 맡은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엠마 톰슨과의 이혼 후 볼품없는 조연급으로 굳어졌지만, 이 50대 아일랜드 영화인에게 메가폰을 맡겼다는 사실은 할리우드가 슈퍼히어로 콘텐츠에 둔 기대의 비중과 방향성을 짐작하게 한다.
'아바타'의 3D 난리법석 이후 영화라는 장르가 어떤 특정 기술 때문에 세계인의 관심을 얻을 일은 당분간 없어졌다. 실험 또는 과시의 시기는 빠르게 막을 내리고 있다. 세계 디자인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 주류를 이뤄가듯, 영화의 이야기 흐름을 방해하고 툭 도드라져 나오는 시각기술은 이미 촌스러워 보인다.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절제한, 보이지 않는 기술. 거품이 걷히고 안정을 되찾은 스크린 위에 할리우드가 선봉으로 내세울 주인공은 분명, 알록달록 코스튬의 슈퍼히어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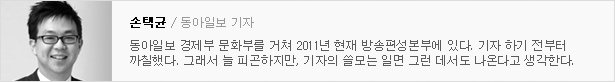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 오·감·만·족 O₂플러스는 동아일보가 만드는 대중문화 전문 웹진입니다. 동아닷컴에서 만나는 오·감·만·족 O₂플러스!(news.donga.com/O2)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