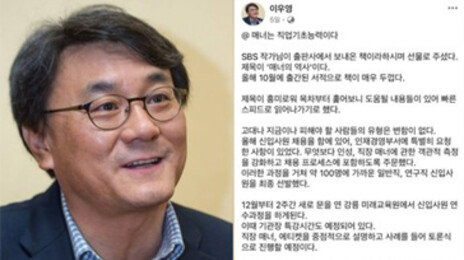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객지’ ‘삼포가는 길’ ‘탑’ ‘섬섬옥수’ ‘한씨연대기’ ‘장길산’ ‘무기의 그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등 그가 절창으로 분출해낸 작품들을 쭉 따라가다보면 마치 여러 형체의 산을 한품에 안고 유유자적하는 하나의 산맥과 같은 형상이다.
거기엔 호젓한 들길을 걸으며 거기 피어있는 이런저런 들풀과 잡목들의 훈향까지 감지되는 듯한 ‘삼포가는 길’ 같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뾰족뾰족한 바위산의 벼랑에서 하늘로 솟구치며 태양을 쪼는 날카로온 매를 연상시키는 ‘객지’류의 작품도 있다. 그야말로 천변만화(千變萬化), 백화난만(百花爛漫)이다.
이미 19세에 등단할 정도로 천부적인 자질을 드러낸 황석영의 문학적 역량과 장인정신은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주를 밀실에 가두지 않고 역사와 현실 속에 펼쳐 놓았다.
그는 삶의 맥박이 뛰고 피내음이 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들어가 그 심장을 움켜쥐고 거기에 살냄새 난무하는 삶의 난장을 만들어 놓는다. 70년대 민족문학 리얼리즘문학의 대표작으로 거론되는 ‘객지’ ‘삼포가는 길’ ‘한씨연대기’ 등은 이른바 산업화로 인한 인간소외 노동문제 분단문제를 본격적으로 형상화한 소설로 당대부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장길산’은 홍명희의 ‘임꺽정’의 뒤를 잇는 작품으로, 해방후 역사소설의 한 아름다운 대미이다. 그리고 ‘탑’ ‘무기의 그늘’은 제3세계(베트남) 문제를 다룬 소설로서 우리 소설의 지평을 세계사차원으로 넓힌 작품들이다.
어디 그뿐인가. 침묵의 은어로 맴돌던, 저 80년대의 암흑 속에 솟구쳐 오른 광주항쟁의 대한 보고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또한 아무도 근접할 수 없었던 북한을 방문하여 기록한 ‘사람이 살고 있었네’ 등등 그야말로 하나같이 역사의 현장에 스스로 몸을 던져 피어올린 언어의 불꽃, 봉화들이었던 것이다.
사실 황석영만큼 폭넓은 산문적 현실을 폭넓게 개진한 소설가는 전무하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90년대도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오늘, 황석영의 이런 면모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온갖 문제적 세계와 현실을 거침없이 녹여내는 그 강철같은 용광로의 산문정신이 참으로 그리워지지 않는가. 세속의 작은 잣대를 들이밀면 그 잣대를 훌쩍 넘어서는 그의 산문적 육체 속에는 그야말로 신령의 기운뿐만 아니라 동물적 야성, 본능까지 함께 어우러져 펼쳐내는, 상생(相生)의 세상, 용화(龍華)세상,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세상을 위한 사회적 대아(大我)의 대장정이 있다.
10년 가까운 침묵을 끌고 황석영이 드디어 돌아왔다. 이제 문학사의 한 산맥이 용트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오랜 침묵 속에 달군 쇳덩이의 큰 울림, 그리고 그 속에서 태어난 큰 사람을 빨리 접하고 싶다.
임규찬<문화평론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