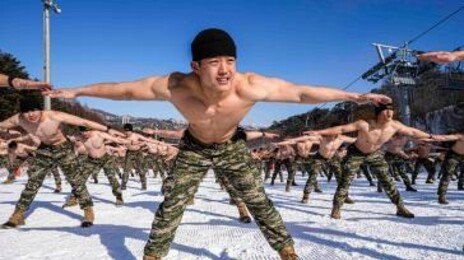예술과 문화를 이같은 시각에서 고찰한 역저 3권이 나왔다. ‘서울에 딴스홀을 허(許)하라’(김진송 지음), ‘미술과 사회’(피에르 프랑카스텔 지음),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존 카터 코벨 지음).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는 1930년대 전후 서울이라는 도시의 일상과 문화에 담겨있던 현대성(모더니티)의 실체를 탐색한 책. 추상적 개념이나 이론에 매달렸던 기존의 현대성 논의와는 다르다. 기록 사진 만화 등 풍부한 자료를 통해 당시의 일상문화(물질과 과학, 지식인 룸펜 데카당, 유행과 대중문화, 신식 여성, 도시 등등)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삼천리’ 37년1월호에 실린 글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를 보자.
레코드회사 관계자, 다방의 마담 여급 기생 여배우 등 그때의 대중문화 종사자들이 서울의 치안 담당자에게 댄스홀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 한 편의 글엔 당시 서울 문화의 한 단면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30년대 서울 종로의 화신 앞을 걷는 것 같고 길모퉁이 카페에 들러 여급과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에 빠져들게 한다. 현실문화연구. 13,000원.
프랑스 미술사학자가 쓴 ‘미술과 사회’는 미술이 한 개인의 발명품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자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미술을 바라본 책이다. 15세기 유럽 미술에서 등장한 원근법이 19세기 이후 인상파 입체파를 거쳐 어떻게 파괴되고 재창조되면서 현대미술에 이르렀는지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고찰한다.
저자는 19세기 당시 혁명적 사회 분위기, 낭만주의적 문화 분위기 등에 힘입어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변혁 욕구가 미술의 이같은 변화에 기여했다고 본다.
미술을 호사가들의 사치품 정도로 이해해선 안되고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민음사. 20,000원.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는 미국인 미술사학자가 쓴 한국 전통문화 이야기다. 저자는 78∼86년 한국에 머물면서 가야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인물.
이 책에서 가야 토기, 신라 금관, 석굴암, 범종, 경주 남산의 불교문화 등을 고찰한 그는 한국 문화의 심연엔 샤머니즘 무속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샤머니즘에 도교 불교 유교 등이 어우러져 한국 전통문화의 흐름이 형성됐다고 결론짓는다. 학고재. 17,000원.
〈이광표기자〉kplee@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