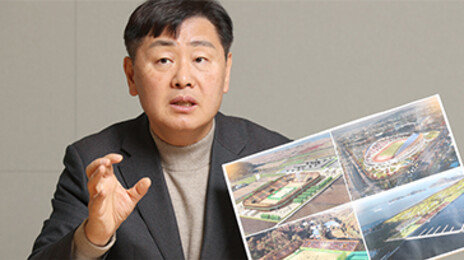그렇다. 한국과 일본의 ‘김치전쟁’. 그건 이미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말부턴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이 ‘피자전쟁’에 돌입했다. 장작 화덕에 피자를 구워내는 이탈리아. 그 피자가 비위생적이고 반환경적이라는 이유로 규제 법규를 만들려는 유럽연합. 자존심 강한 이탈리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했다.
어디 이뿐이랴. 패스트푸드의 급속한 전파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전통 음식과의 갈등을 유발한다. 게다가 자국의 전통 음식이나 타민족의 음식에 대한 관심, 퓨전 푸드에 유전자조작 콩 문제까지 좋든 나쁘든 음식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더욱 커져가는 지금이다. 음식은 더 이상 사적(私的)이지 않다. 여성만의 영역도 아니다. 공적(公的)이고 사회적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역사 경제 종교 민족 권력 등과 음식의 관계를 통해 음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위나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음식은 시대와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 저자의 기본 생각.
저자는 김치박물관에서 8년 동안 김치를 연구했던 소장 문화인류학자.
그는 현장답사와 사료 읽기를 통해 음식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음식의 이면, 음식에 대한 우리의 오해도 들추어낸다.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의 음식 이야기여서 흥미롭다.
김치와 간장 등 한국의 발효음식은 한국의 옹기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처럼 의미와 깊이도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전체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읽힌다는 사실을 말해야겠다.
음식 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줄줄이 엮여 나온다. 이런 식이다.
리의 주식인 밥 얘기. 숭늉이 빠질 수 없다. 숭늉엔 포도당이 녹아 있다고 말한다. 그 포도당은 짠 발효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의 알칼리성을 중화시켜준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고도의 과학이 숨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커피 얘기로 나아간다. 유난히도 커피를 좋아하는 한국인. 커피 열매를 볶는 과정에서 나오는 구수한 맛 속엔 포도당이 들어 있다. 한국인에게 커피는 일종의 숭늉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세기초 한국에 커피가 처음 들어왔을 때 커피에 관한 찬반논란이며, 최초의 커피숍이며, 노점 커피상들의 판매 경쟁 얘기 등을 오가면서 읽는 이를 즐겁게 한다.
권력과 음식의 관계도 그렇다. 시대를 막론하고 지배세력들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음식을 이용했다. 즉, 귀한 고급 요리를 먹는 것은 일종의 권력행위였다. 군주시대엔 더더욱 그랬다. 그러다가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자 왕이 독점하던 궁중 음식은 명월관 태화관 같은 고급 요리집으로 넘어갔다. 이 요리집(요정)은 권력욕 식욕은 물론 색욕까지 해소시켜주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한 시대, 권력의 한가운데 있었던 요정은 80년대 룸살롱에 의해 서서히 밀려났다.
음식을 둘러싼 이야기는 이처럼 다양하고 흥미롭다. 음식을 생존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세간의 편견을 교정시켜준다. 음식 하나하나에 숨겨진 사회문화적 의미를 읽어낼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적 방법론이나 문화사적인 고찰이 정교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341쪽, 9800원.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