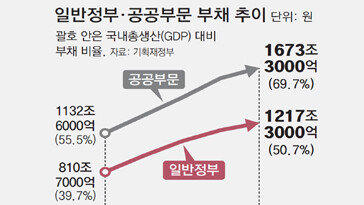문명의 디자인은 동과 서, 남과 북, 메마른 땅과 습한 땅, 고지와 저지, 고대와 중세 근세 등 공간이 바뀌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유구한 인류의 문명이 태어난 현장을 돌아보며 그것이 남긴 디자인들을 살펴본다.》
▼우주 지배 상징 치밀한 설계▼
카이로의 신시가지 타흐리르 광장을 출발해 버스가 선 곳은 타마린드와 유칼립투스, 아카시아 등이 무성한 푸른 잎을 자랑하고 있었다. 피라미드와 푸른 수목,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의 공존은 예상대로 그리 오래 가지 못 하고 곧바로 빛 바랜 누런 모래땅 위로 역시 누런 색의 피라미드가 고개를 내밀었던 것이다.
평평하면서도 황량한 지평선 위에 우뚝 서 있는 피라미드는 하나의 거대한 돌탑으로 보였다. 작은 소망을 담은 돌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것이 우리네 돌탑이라면, 피라미드는 대체 무슨 소망을 담고 있기에 저토록 거대한 것일까.
허공 속에 정확히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피라미드는 참으로 거대하다. 고개를 뒤로 힘껏 젖히고 올려다보아도 그 끝은 가물가물, 멀기만 하다. 매표소를 지날 때까지만 해도 싱글벙글하던 사람들이 피라미드의 정상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엄숙해지면서 자세마저 바꾼다. 거대함에서 오는 경외감 때문이리라.
밑변 한변의 길이가 230.7m, 높이만도 146.7m(꼭대기의 일부가 허물어진 지금은 143m)인 피라미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고 있는 돌 하나하나 역시 사람 키를 훨씬 넘는 거석(巨石)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지극히 단순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 단순함 뒤에는 놀랄 정도의 정밀함이 감추어져 있다. 밑변의 각 변은 동서남북 네 방위를 정확히 가리키며, 밑변들간 길이의 오차는 0.1% 미만이다. 돌과 돌 사이에는 머리카락 한 올 들어갈 틈도 없다. 현대 기업들이 최고의 정밀도로 질의 경쟁에서 승리하자며 부르짖는 ‘ppm경영’을 고대이집트인들은 그때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라미드 건축에 동원된 고도의 천문학적, 지리적, 수학적 지식이다. 밑변 한 변의 길이에 480을 곱하면 이 지역의 지리상의 위도 1도 길이인 11만800m가 되고, 한변의 길이를 당시의 길이단위인 피라미드 인치로 환산하면 365.242가 되어 1년의 날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 피라미드의 높이를 10억배 연장하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인 1억4694만4000km가 되고, 밑변 둘레를 높이의 2배로 나누면 3.144…, 즉 π(원주율)의 값이 된다. 이런 이유로 기자에 있는 세개의 피라미드,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축조된 대피라미드는 세계 곳곳에 산재한 수많은 거석축조물(스톤헨지, 고인돌, 선돌 등)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란 평가를 받는다.
▼돌 하나 하나는 '시간의 조각'▼
평평하면서도 황량한 사막의 지평선. 그것은 말하자면 죽음의 상징이다. 당시 이집트왕국의 수도 멤피스에서 본다면 기자는 나일강 너머의 서쪽, 태양이 밤의 신 누트에게 먹히는 곳이다. 이를테면 죽은 자의 세계였던 셈이다. 파라오는 죽은 자의 세계 위에 그어진 지평선에 2.5t짜리 바위 270만개를 동원하여 201개의 계단을 가진 각추형(角錐形) 입체공간을 세웠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지구의 축소판 내지 소우주로서 파라오가 사후에 살 집이었다. 그러므로 피라미드의 축조는 혁명이었다. 그는 나아가 거대한 돌집 한가운데에다 그의 방을 만들고는 두 개의 환기구멍을 뚫어 바깥과 연결시켰다. 그 속에 살면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싶어서였다.
그렇다. 피라미드를 축조한 파라오는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것이다. 이승의 삶이 이렇게 좋은데 어찌 그걸 멈추고 싶겠는가. 설령 심장이 멎는다 하더라도 그 몸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미라를 보라) 재생(再生·Reincarnation)하여 ‘제2의 삶(After-Life)’을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피라미드를 받치고 있는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시간의 조각이며, 그들은 시간의 조각들을 그렇게 높게 쌓으면 영원에 이를 것이라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피라미드의 특이한 형태와 거대함, 그리고 거석구조를 해석할 길이 없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승의 모습을 축약시킨 소우주를 제2의 삶의 공간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다행히 그들은 나일강의 수위 변동에 따라 파종과 수확 등을 결정해야 했기에 시간의 경과를 측정하는 척도와 토지의 분배, 조세의 징수를 위해 길이와 무게를 재는 척도들도 일찍부터 확보하고 있었다. 천문학과 지리학, 기하학과 수학의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이 완성한 파라오의 꿈▼
영원에의 의지는 저승의 것을 목표로 한다면 권력에의 의지는 이승, 즉 현세를 지향한다. 영생의 꿈은 현세의 권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낱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 것. 파라오가 진정 원했던 것은 다름아닌 이승의 권력이었다. 파라오가 피라미드 밑변의 각 꼭지점을 동서남북 네 방위에 정확히 맞춘 것도 지상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다름없었던 것이다.
어린 시절을 피라미드 주위에서 뛰놀면서 보냈던 고(故)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피라미드는 절대 노예노동의 산물이 아니었다. 종교적인 동기와 경제적 번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지만 파라오의 손에 권력이 쥐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거대한 돌은 누가 옮기고, 또 그것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았겠는가. 그러므로 피라미드는 파라오를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에 관리와 백성들을 각자의 신분과 역할에 따라 배치한 ‘수직적 권력구조도’라 할 수 있다. 시간의 탑은 이렇게 권력의 탑도 되었으니 권력자란 시간의 지배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시간을 공간 속에 가두기 위해서는 막강한 권력이 필요하므로 시간의 지배에 따른 혜택도 소수의 권력자의 몫이 된다. 그리고 그 달콤함을 영원히 즐기고자 다수를 옥죄는 지배구조를 유지한다. 이제 21세기, 인류는 이제 스피드와 네트워킹을 통해 시간은 물론 공간의 한계마저 극복하며 그 동안 대다수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했던 국적과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지위와 같은 장벽을 일순간 걷어내고 있다.
인류가 수직구조의 피라미드 사회로부터 인터넷이 지배하는 수평구조의 사회로 옮아오는데 자그만치 4500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걸렸다. 그것이 5000년 인류문명사이다. 아무튼 우리는 인류 전체의 역사와 우주의 공간 모두를 내 속에서 만나게 되는 디지털시대를 맞았다. 우리는 이제야 내 뜻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의 디자이너’가 된 것이다. 우리 앞의 21세기는 바로 그런 시대다.
▼필자 권삼윤은 누구?▼
1951년 생. 한국외국어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보증보험 외국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 국제국,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부를 거쳐 현재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본부장으로 재직중이다. 문명이 태어난 현장을 찾아 지금까지 60여개국을 답사, 역사여행가 겸 문화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 ‘두브로브니크는 그날도 눈부셨다’(1999) ‘우리 건축, 틈으로 본다’(1999) ‘태어나는 문명’(1997) 등의 저서를 냈다.
어린이 레포츠 >
-

횡설수설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데스크가 만난 사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어린이레포츠]실내 인공암벽 등반 끈기-지구력 키워](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2/05/684754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