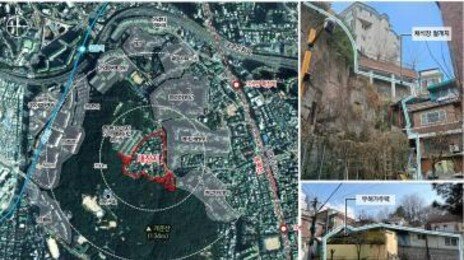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조성기는 다시 한번 만화경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조망한다. 이제 막 출간된 ‘종희의 아름다운 시절’(민음사)에서 그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의 비극적 역사와 그 틈새에서 고통받아온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그러한 아날로그적 소재를 작가 특유의 렌즈를 통해 다분히 디지털적인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예컨대 이 소설은 종희로 대표되는 우리 모두의 슬픈 역사를 시종일관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간결하고도 하드보일드한 문체로 서술해나가고 있다. 아무런 기교도 또는 접속사도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소위 ‘롱테이크’ 기법을 통해, 작가는 비극적인 우리 과거사를 한 폭의 은은한 수채화로, 또는 빼어난 영상미학으로 바꾸어놓는데 성공한 것이다.
롱테이크 기법은 이광모 감독이 ‘아름다운 시절’에서 채택했던 서사기법이다. 결코 아름답지 못했던 우리들의 슬픈 추억들을 이광모 감독은 그 영화에서 담담하고 아름다운 영상 풍경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조성기 역시 만화경의 렌즈를 통해 우리들 마음의 화면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이미지들을 투사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종희의 아름다운 시절’은 문학과 영상의 이상적인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 한 좋은 예가 된다.
영화 ‘아름다운 시절’을 보고 나서, 조성기는 15년 동안이나 묵혀두었던 예전 집 여주인 이종희의 육성 테이프들을 꺼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국 근세사의 아픔과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구술역사(Oral History)인 그 테이프를 토대로 작가는 이 시대의 문학이 해야할 일―즉 존재와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의 인식을 깨우쳐주는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육성을 문자로 옮기고, 다시 그 문자를 이미지로 전환하는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다 읽고 책을 덮은 후에도, 작가가 만들어놓은 강렬한 이미지는 좀처럼 우리 마음 속 스크린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종희의 아름다운 시절’은 물론 한국인들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 상황으로 승화된다. 예컨대 이 소설의 압권인 세 번째 장에 등장하는 타타르인들이나 미군 포로들은 모두 한국전쟁의 피해자들로서 한국의 운명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작가는 그러한 대승적 안목을 통해 한국인의 비극을 인간 모두의 비극으로 확대한다. 이 장에서 작가는 시공을 초월한 세 개의 각기 다른 이야기를 마치 끝없이 교차하는 영화장면처럼 중층으로 깔아놓고 있는데, 이러한 영상 서사기법은 소설 양식의 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서술기법 면에서 첫 두 장 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 세 번째 장의 또 다른 백미는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과 짐승의 습성 비교이다. 해박한 동물학적 지식을 통해 작가는 인간이 얼마나 짐승과 비슷한지, 또는 짐승만도 못한지를 예시해주고 있다.
미국작가 존 도스 패소스는 ‘미합중국 삼부작’에서 ‘촬영기의 눈’과 ‘뉴스 릴’ 기법을 사용해 당대의 미국사회에 대한 생생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 ‘종희의 아름다운 시절’ 역시 영상모드의 도움을 받아, 이제야 겨우 치유되기 시작한 이산가족들의 오랜 고통과 상처를 새롭게 조명해주고 있다. 조성기의 이 특이한 소설은 리얼리티를 바라보는 방법이 사실은 무궁무진함을, 그리고 우리의 슬픈 과거도 글쓰기를 통해 얼마든지 만화경 속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뀔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김성곤(문학평론가·서울대교수)
출판 >
-

광화문에서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출판가]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아내의 상자」 돌풍](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