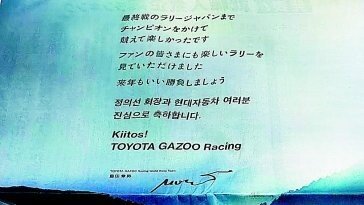김씨는 그것이 인스턴트식품과 손맛과 정성이 담긴 요리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리모컨 하나로 모든 동작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개입할 여지없이 0과 1로만 이루어진 삭막한 디지털의 세계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아날로그의 깊은 맛.
우리나라에서 레코드판이 CD에 밀려 마지막 판이 발행된 것은 87년이었다. 뜨는 디지털과 지는 아날로그를 상징하며 마지막 승부를 벌였던 양자의 대결은 거기서 끝난 것일까.
레코드 수집가에서 중고레코드상으로 변신한 김씨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아날로그가 끝났다고요? 결코 아닙니다. 요즘 음악 애호가나 오디오 마니아들은 CD가 아닌 아날로그의 손을 들어줄 정도입니다. 아날로그의 매력은 디지털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코 채워줄 수 없거든요.”
| ▼관련기사▼ |
그는 연세대 철학과 1학년 때였던 89년부터 음악에 빠져 닥치는 대로 음반을 모았다. 몇 달동안 청계천 황학동시장을 돌아다닌 끝에 신중현과 한대수의 금지곡 음반을 찾아냈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경험이다. 대학시절 내내 중고레코드상점이 자리잡은 서울 중구 회현동 회현지하상가를 제집 드나들 듯했고, 첫 직장을 2년만에 때려치운 뒤 결국 3년전 이곳에 직접 ‘고랑’을 차렸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 이곳은 지금 ‘아날로그 예찬론자’들의 아지트다.
가게를 연 뒤로는 한두달에 한차례씩 해외로 나가 외국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음반을 사들여 온다. 희귀 음반을 찾아 웬만한 유럽의 도시들은 안 가본 곳이 없다. 여비가 떨어져 낯선 곳에서 노숙을 하기도 다반사. 그렇게 어렵게 구해온 희귀 음반들은 몇백만원에 팔리기도 하지만 막상 팔 때는 애써 키운 자식 내보낼 때처럼 안타까울 때가 더 많다.
과연 이렇게 빠져들 만큼 아날로그에 매력이 남아 있는 것일까.
“단지 사라진 옛 것에 대한 향수만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아날로그에는 있어요.”
김씨는 아날로그만의 그 ‘무엇’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 세계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재미’를 들었다. 디지털에서의 잡음 하나 없는 깨끗함과 완벽함은 오히려 매력없는 ‘기계의 세계’로 느껴진다. 그런 면에서 아날로그는 사람에 더 가깝다. 김씨를 비롯한 ‘아날로그맨’들이 찾는 것은 결국 사람의 향기가 아닐까.
<박윤철기자>yc97@donga.com
드라마 e장소 : 카페 >
-

담배 이제는 OUT!
구독
-

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구독
-

유윤종의 클래식感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드라마 e장소/카페]홍대에서 드라마 촬영장소로 유명한 '테마'](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