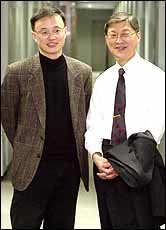
4·19세대의 사회과학자로 1980년대 지식인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회구성체 논쟁의 주역 이대근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62), 그리고 대학 시절 운동권 이론가로 두각을 나타냈던 386학자 이진경 씨(38·사회학박사). 치열하게 살아온 시대가 달랐기 때문일까. 처음 자리를 함께 한 두 사람은 시종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대근〓한국현대사에서 4·19가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사실 4·19 때보다 3년 후 6·3세대의 학생운동이 훨씬 치열했고, 80년대 학생운동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학생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4·19세대가 정권교체를 했다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진경〓4·19는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바로 전에 5·18 광주항쟁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4·19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너무 밝으면 별은 안 보이니까요.
▽이대근〓4·19혁명 1년 만에 5·16이 터지는 바람에 4·19 정신이 5·16 주동자들에 의해 부정되거나 왜곡됐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4·19는 한국 사회를 보는 시각을 바꿔놨어요. 4·19 당시는 잘 몰랐지만, 학생 데모가 정권교체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1958년을 정점으로 한 세계 정세의 변화 탓도 매우 컸습니다.
당시 미국은 후진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유상원조로 바꾸고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적극 유도했는데 이승만 정권이 이같은 세계 흐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으며 한편으로 국내 정치에도 실패해 사회적으로 불만이 폭발직전에 이르렀던 거죠. 이것이 4·19의 학생운동을 계기로 불거져 정권 교체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 관점은 80년대를 바라볼 때도 꼭 필요합니다. 80년대 이념논쟁과 학생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의 약화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두환 정권이 자신감을 갖고 이념서적들을 해금시킨 데 주요 원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변혁의 문제를 국내 문제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환경요인과 함께 보도록 만든 것이 4·19라고 봅니다.
▽이진경〓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전혀 다른 80년대를 산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저희가 겪은 80년대는 무겁고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자유주의자나 낭만주의자란 말은 민중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욕이었어요. 80년대에 저희는 오직 혁명을 위해 공부하고, 노동현장에 뛰어들고, 조직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고를 좁게 한 점은 있었지만, 삶 속에서 뭔가 끝까지 밀고 가는 훈련을 알게 모르게 받게 된 것이지요.
80년대에 대해 두 사람의 인식은 심각한 단절이 보인다. 한쪽은 한국사회에서 일정한 기득권을 가진 교수의 신분으로, 다른 한쪽은 순수하게 이상을 추구했던 학생의 신분으로 80년대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인식차이는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이대근〓학생은 몰라도 교수들은 80년대에 이념서적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고, 해방 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념논쟁을 벌였습니다. 80년대는 이미 암울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서구에서는 이미 70년대를 지나면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바뀌었지요. 사회주의 국가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생산력 발달’을 누가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나뉘게 됐어요. 이런 관점에서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이 이전 정권에 비해 진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진경〓혁명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삶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4·19세대인 김윤식 김진균 김지하 등이 구축해 온 학문이나 문학의 세계는 4·19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80년대 저희 세대에게 ‘혁명’이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에 드리워졌던 어둠을 진정으로 반성해 본다면 80년대를 무책임하게 밖에서 바라보며 회고조로 이야기할 수는 수 없을 겁니다.
▽이대근〓사회구성체 논쟁 때 제가 박현채 선배의 일국(一國)자본주의, 일국혁명론을 비판한 것은 자본주의가 이미 세계적 차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식 구조조정 모델만 강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민족경제’를 운운하는 것은 실체 없는 허구를 좇는 것이예요. 4·19가 준 중요한 교훈은 국제적 시각에서 한국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진경〓80년대에는 저도 민족주의에 반대해 싸웠지만 그렇다고 민족주의를 나쁘다고만 몰아붙여서도 곤란합니다. 오히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는 노동자와 자본이 함께 구조조정을 해 나가지 않고 자본의 영역은 그대로 놔둔 채 감원과 임금 삭감 등 노동자에게만 구조조정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80년대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것은 모두가 함께 사는 상생(相生)적 세계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각각 ‘국제적 관점’과 ‘민중과 함께하는 삶’을 주장하는 이들의 관점은 현재의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들의 대담은 4·19 세대와 386 세대 사이에는 사상적 간극이 엄존함을 일깨워주었다.
◇이대근교수 약력
△1939년생
△서울대 상대 및 대학원 졸업
(경제학 박사)
△현재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저서: ‘세계경제론’,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자본축적’, ‘한국경제의 구조와 전개’, ‘성장의 허상, 외채의 허상’ 등
◇이진경씨 약력
△1963년생
△서울대 사회학과 및 대학원 졸업
(사회학 박사)
△현재 연구공간 ‘너머’와 서울시립대 성공회대에서 강사로 활동중
△저서:‘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 ‘한국사회와 변혁이론’,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철학과 굴뚝청소부’, ‘수학의 몽상’ 등
<정리〓김형찬기자>khc@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