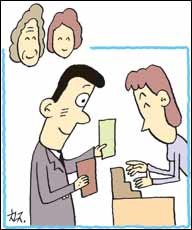
대화가 어린이날로 번졌다.
“어린이날 무슨 좋은 계획이 있니?”(의사)
“뭐 별로. 평소 잘해주면 그만이지. 무슨 날이라고 굳이 ‘의무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을까.”(아들)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요즘은 일년 365일 중 매일 매일이 어린이날 아니냐. 뼈빠지게 일해 애들 교육시키고 외식도 자주 시켜주지만 아이들이 어디 아버지 고마운 줄 알기나 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는 게 요즘 ‘애비’들이야.”(할머니)
“맞아요, 어머니. 예전에는 생선 한 토막이 생겨도 아버지 앞에 놓아드리곤 했고, 아버지가 잡수시고 남겨야 아이들 차지가 되곤 했는데….”(며느리)
“그래요. 아버지들이 정말 불쌍해요. 이번 어린이날은 정말 ‘아빠’를 쉬게 해드려야겠어요.”(딸)
식사 후 계산은 ‘애비’와 ‘아빠’가 했다.
<오명철기자>oscar@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동양철학의 고향을 찾아서]③ 이세신궁](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10/20/6874657.1.jpg)

![[사설]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이주·교통 대책이 관건](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522442.1.thumb.jpg)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02416.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