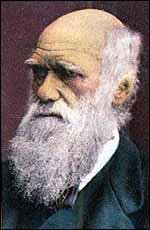
브루스 매즐리시 지음 김희봉 옮김
396쪽 1만8000원 사이언스북스
역사란 해석이다. 그 많은 사료를 어떻게 얽어 해석해 내느냐에 따라 우리는 역사에서 지혜를 깨우치기도 하고, 갖가지 생각의 실마리를 얻게도 된다. 그래서 역사는 낡은 것이면서도 언제나 창조적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역사책이 읽히고, 사극이 인기리에 방송되고, 역사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이 장수하는 것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저명한 미국의 지성사학자인 저자의 이 저서(원제:THE FOURTH DISCONTINUITY―The Co―evolution of Humans and Machines·예일대출판부·1993)는 바로 역사 속에서 인간다움의 원천을 해석하고, 오늘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서양사상사의 전통을 네 가지의 ‘불연속’ 현상으로 해석하고, 그 마지막 불연속의 본질을 밝히면서 인간의 장래를 예언하고 있다.
원래 인간은 우월감을 가지고 역사를 살아 왔다. 그 우월감의 근원에는 몇 가지 ‘불연속’ 현상이 있었다. 첫째 인간의 사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상인데, 그것은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깨졌다. 둘째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주장인데, 다윈의 진화론은 그 환상마저 부셔버렸다. 셋째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을 좌우하는 의식의 주체라 여겨졌는데, 프로이트이래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허약한 존재로 전락했다.
그래도 인간은 인간이 만든 도구와 기계의 놀라운 발달 가운데, 그 지배자로 살아왔다. 하지만 인간은 이제 기계의 주인 자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 이 부분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네 번째 불연속’이다.
그는 오늘날 기계문명의 대표로 ‘컴퓨터화한 로봇’을 예로 들고 여기에 ‘컴봇’이란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저자는 컴봇과 인간이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설명한다.
또 이미 인간이 기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계는 독자적 발달 단계로 들어섰다고 판단한다. 인간과 기계는 이미 공동의 진화 과정에 들어섰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그가 이 책에 붙인 부제(副題)가 ‘인간과 기계의 공동진화’다.
주로 과학사를 내용으로 하면서 저자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해 데카르트의 철학적 성찰,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 로봇이란 말을 우리에게 남긴 카렐 차펙의 희곡, 찰스 바비지의 계산기 등 많은 역사적 사실을 해박하게 섭렵하고 있다.
그의 논평은 프랑켄슈타인, 로보캅, 터미네이터 등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까지 미친다. 컴퓨터는 발달을 거듭하여 인간의 두뇌를 훨씬 능가하고 있고, 인체는 이미 공상과학 영화가 보여주듯 고도로 기계화하고 있다. 인체의 여러 장기가 인공장기로 갈아 끼워지기 시작했으며, 인간 복제까지 가능해지려는 단계에 우리는 서 있다.
그러나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을 밀어내지는 못할 것이며, 기계가 인간을 생산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저자는 젊었을 때 브로노프스키와 함께 ‘서양의 지적전통’(1960)을 써서 이미 국내에도 알려진 미국 MIT의 역사학 교수다. 또 이 책은 1967년 ‘기술과 문화(Technology and Culture)’라는 학술지에 발표해 토론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 그는 이 책을 펴낸 무렵부터 다른 역사학자들과 함께 ‘지구사(Global History)’ 운동을 말하고 있다. 그 전까지 역사가들이 해 오던 ‘세계사(World History)’가 지나치게 근대 이전에 머물고 있는 것과 달리 이미 ‘지구촌’이 돼 있는 세계의 역사는 오늘의 인간의 문제를 기초로 거꾸로 생각하는 역사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이다.
1999년 그는 또 ‘불확실한 과학(The Uncertain Sciences)’을 출판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연과 달리 ‘끊임없이 진화해 가는 인간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간과학’이 바로 ‘불확실한 과학’이란 것이다. 과학사를 소재로 그는 오늘날의 황폐화하고 있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외친다. 특히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한국의 지식인들이 생각해야할 과제라 생각된다.
김동주의 여행이야기 >
-

한규섭 칼럼
구독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동주의 여행이야기]태국 매홍손 '카렌족의 여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3/10/21/690577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