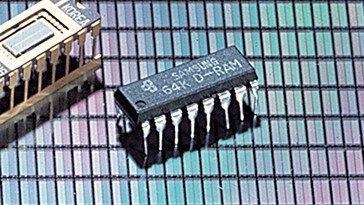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옮기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중 시는 사용된 낱말의 수에 비해 많은 무게를 지닌다. 그래서 쓰기도 읽기도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에게 ‘시’는 그 상상력을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그릇이다. 그래서 문학과 철학을 강조하는 나라들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시 읽기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의 동시를 교과서에서 만난다. 그리고 동시를 ‘꾸며주는 말의 반복’정도로 여기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12일에 있었던 ‘초등 국어 교과서와 문학교육’이라는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세미나의 자료에 따르면 국어 교과서에서 문학은 사라져 가는 것 같다. 학교에서는 가장 언어적 함축이 뛰어나다고 하는 시 언어조차 ‘언어 사용 기능 교육’ 속에서 가르쳐지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에 1000편이 넘는 동시가 여러 지면들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동화처럼 단행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가 발표되는 어린이문학지들을 보는 계층도 한정돼 있어 미처 아이들 눈에 띄지 못한 채 잊혀진 동시로 남게 된다.
2000년 한 해 동안 발표된 1000편의 동시 중 49편을 가려 뽑은 ‘닭들에게 미안해’는 이런 측면에서 참 반갑다. 이제 막 구워낸 빵처럼 따끈한 동시들을 큰 수고 없이 한 눈에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책 속에는 ‘일등’과 ‘컴퓨터’와 ‘가방’에 쫓기는 아이들의 무거운 현실이 눈에 띄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등’ ‘봄눈’ ‘난초’ 등 가족 간의 관계맺음을 보여주는 글들도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권정생 선생의 ‘물총새 이야기’가 참 좋다. 정말 쉬운 말 몇 줄인데 긴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이다. 작품 속의 ‘줄줄’과 ‘쪼꼬맣게’가 그렇게 영상적인 언어임을 선생은 어떻게 아셨을까?
아이들의 숨겨진 마음을 풀어줄 말, 동시 속에 있다. 초등학생 누구나 읽어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공재동 외 지음 강산 그림, 112쪽 6000원 현대문학북스
김혜원(주부·37·서울 강남구 수서동)
드라마 e장소 : 술집 >
-

사진기자의 사談진談
구독
-

트렌드 NOW
구독
-

이문영의 다시 보는 그날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드라마 e장소/술집]'부담없는 가격, 그러나 안주는 푸짐'](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