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영어학원에 다시 다닌다. 영어학원을 바꿔봤지만 역시 스파르타식인 C학원이 낫다. 한꺼번에 단어 200개를 내주고,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을 보는 C학원에 처음 다닐 때 김양은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김양은 99년 중 3 겨울방학 때 수도권 한 신도시에서 이사왔다. 전학온 뒤 반 등수가 8등 정도 떨어졌다.
“전에 있던 도시에서는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해도 유지는 됐어요. 여기서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유지는커녕…. 이곳에선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열심히 하는 게 신기해요.”
학원이 끝나면 바로 집에 온다. 대치동으로 이사와 좋은 점은 걸어서 학원에 다닐 수 있다는 것. 김양이 다니는 학원은 모두 도보 15분 거리 안에 있다. 대신 치과의사인 아버지는 예전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매일 먼거리를 출퇴근한다. 그래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학원이 끝나면 바로 집에 온다. 김양이 다니는 학원 중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국어학원과 과학탐구학원. 그래봤자 걸어서 10분 거리다. 치과의사인 아버지의 병원이 예전에 살던 도시에 있어 아버지가 매일 먼거리를 출퇴근해야 한다.
낮시간은 단짝 친구와 전화로 수다를 떠는 유일한 시간. 예전에는 하루 1시간씩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고3을 앞둔 요즘은 꿈도 꾸지 못한다. 학원 숙제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나면 인터넷을 하면서 논다. 프리챌에 개설된 같은 국어학원 아이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 게시판을 본다. 익명게시판에서 강사에 대한 험담을 보고 킬킬댄다. 어떤 학원이 무슨 강의를 하는지 학원 사이트를 둘러보고 야후 뉴스를 읽어본다. 학원만 하루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가 십상이다. 주말 개봉 영화를 찾아보기도 하지만 이내 ‘참, 주말에 과학탐구, 사회탐구 학원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난다.
학원 숙제를 하다 보면 솔솔 잠이 온다. 요즘은 자꾸 낮에 졸린다. 꾸벅꾸벅….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신차려. 빨리 밥 먹고 학원 가야지!” 벌써 오후 1시반. 엄마는 꼭 따뜻한 밥을 챙겨주려 한다. 공부를 강요하는 편은 아니지만 “남들은 이렇게 한다는데…” 하는 말에서 엄마의 불안과 걱정을 읽는다.
2시부터 4시까지는 국어학원 수업. 영수학원이지만 방학에 국어특강을 하고 있다. 오후에 국어학원 강의가 또 있기는 하지만 국영수는 2개씩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 이것도 들어야만 마음이 편하다.
이어 4시에 시작하는 과학탐구를 들으러 달려간다. 스타인 L강사의 강의는 일요일에 있지만 화요일 목요일에는 L강사의 밑에 있는 강사들이 L강사의 강의내용을 복습시켜준다. 오늘은 물리시간. 워낙 싫어하기도 하지만 너무 지루하다. 앉을 자리가 모자라 화장실에 다녀올 때도 수강증 검사를 철저히 하는 L강사의 강의와는 달리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하나 둘 빠져나간다. 8시까지 수업이 진행돼 배가 고프다. 1시간마다 10분씩 쉬는 시간에 학원 매점은 빵이나 과자를 사려는 아이들로 붐빈다.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가 저녁을 먹는데 얼굴 보기 힘든 누나가 반가워 장난을 치는 남동생(15·대청중 3년)과 사소한 말다툼을 한다. 가볍게 넘길 동생의 행동에 예민해진 탓인지 화가 난다.
9시 반 국어학원. 엄마가 동네 분들에게 듣고 추천한 학원이다. 원장이 혼자 모든 강의를 하는 작은 학원이다. 한 클래스에 9, 10명이라 학교와는 달리 중간에 질문해도 미안하지 않다. 강사는 강의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준다. 낙태 관련 논술을 쓴다면 관련 뉴스와 동영상을 자료로 제시하는 식이다. 자료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이해가 된다.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김양은 학교보다 학원을 신뢰한다. 강사들의 열정과 실력은 물론이고 상담할 때도 학원이 낫다고 생각한다. 학교 상담이래 봤자 학기 초에 잠깐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적응 잘 하고 있냐?” “…, 네”라는 대화가 전부다. 김양은 스타강사인 L강사에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수서에 있는 L강사 사무실까지 엄마와 함께 새벽 2시에 찾아갔다. L강사는 피곤한 가운데도 성의껏 상담에 임했다. 그래도 친구는 역시 학교친구다. 학원이란 ‘혼자 갔다가 혼자 오는 것’이다.
오후 11시에 국어가 끝나면 빈 강의실에서 12시에 시작될 수학강의를 기다린다. 수학강의는 50명 정원의 강의실에 70∼80명이 빽빽이 찬다. 무섭긴 하지만 수학강사는 ‘교주’라며 자기만 믿으라고 한다. 새벽 2시가 넘어 수업이 끝났다. 엄마들의 자가용 행렬이 눈에 들어 온다. 12시간 가량을 학원에서 보내고 김양은 엄마가 몰고온 차에 올라 눈을 감는다.
▼취재기자가 여고 2년땐...
1993년 겨울, 고3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바로 윗 학년 언니들 때부터 대입제도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어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적응에 발을 동동 구르던 때였다. 6주여의 겨울방학 동안 4주가 보충수업이었다.
학교에서는 오전 4시간 동안 국영수와 사회, 과학 수업을 했다. 교과서 진도는 학기 중에 다 나가기 때문에 주로 수능 문제집을 갖고 문제풀이를 하는 식이었다. 오후에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자율학습을 했다. 집에 가면 공부가 잘 안된다고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 공부했다. 수학을 못했던 나는 수학을 별도 지도받기도 했다.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는 학원 특강으로 정리했다.
가끔 학원 강사가 더 잘가르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학교가 훨씬 중요하고 학교선생님은 학원강사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믿을 곳은 학교 뿐이었다. 그때는 그랬다.
채지영 기자 yourcat@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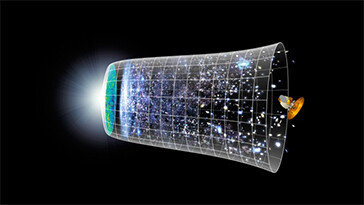

![‘시그널 게이트’… 나사 풀린 트럼프 사람들[횡설수설/김승련]](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300524.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