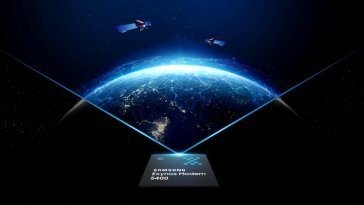▷그러나 이들보다 앞서 탐욕의 본질을 갈파한 이가 있다. 1987년에 나온 영화 ‘월 스트리트’ 속 금융의 귀재 고든 게코다. 그는 “탐욕은 선이다. 탐욕은 효과를 낸다. 탐욕은 옳다…”는 열변을 통해 탐욕이 자본주의의 성장 엔진이라던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쉽게 풀어주었다. 특히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 능력 위주의 ‘미국식 경영’ 아래서 일하는 미국인들은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두어야 한다. “좀 덜 일하고 돈을 좀 덜 받겠느냐?”는 질문에 독일인의 38%, 일본인의 30%가 그러겠다고 한 반면 미국인은 8%만이 예스 했다는 조사 결과도 브레이크 없이 달려만 가는 미국의 현실을 보여준다.
▷탐욕을 다스리는 데도 동서양의 차이가 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명아줏국도 고깃국보다 맛있게 여긴다’는 채근담 문화권에선 개인의 도덕성에 무게를 두는 반면, 사악함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믿는 홉스의 문화권에선 시스템으로 탐욕의 발호를 막으려 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삼권 분립의 틀을 엄격하게 짜놓은 것도 인간은 감시와 견제가 없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존재임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재벌이 대통령 되고, 법과 의회도 돈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패거리 자본주의’가 춤을 추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도 더불어 흔들리는 형국이 됐지만.
▷문제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어서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불치병이라는 점이다. 존 업다이크는 돈과 섹스의 공통점이 아무리 많아도 충분치 않은 것이라고 했다던가. “한나절 동안 걸어 돌아올 만큼 땅을 가지라”는 악마의 말에 저물도록 걷기만 하다 쓰러져 죽은 톨스토이 우화 속의 농부처럼, 딸을 황금으로 만들어놓고 통곡하는 미다스의 왕처럼, 그렇게 죽거나 망할 때까지 ‘미국식 탐욕’을 키우기만 할 것인가. 탐욕은 부와 더불어 커진다는데, 그렇다면 부자가 아니어서 욕심도 그저 ‘겸손’할 뿐인 내 처지를 차라리 고마워해야 할는지.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 >
-

인터뷰
구독
-

기고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충무로 반항아' 임상수 감독](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